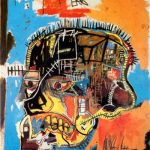복전(福田)
복전(福田). 직역하면 복밭이다. 원래 이 말은 복덕을 생성하는 근원을 뜻하며, 부처 또는 승려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1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식 의례를 삼귀의례(三歸依禮)로 시작한다. 그 의례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 합니다[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歸依僧 衆中尊]”를 염(念)하는 것이다. 승려를 복덕을 생성하는 근원이라고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만나는 승려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덥지 않아보이는 경험을 많이들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가는 그렇게 할만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불가에서는 억겁의 윤회 동안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이 승려가 되어 속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선업을 쌓도록 이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는, 승려는 억겁의 세월동안 속세 사람들의 인도자 내지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선업을 쌓은 사람이므로, 속세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귀의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는, 승려 만이 복전일 수는 없을 듯하다. 구제를 받는 대상도 복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승려 뿐만 아니라 부처도 그 구제받을 대상이 있었기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선업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의 초기 경전의 하나인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 먼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다음으로 부처가 설한 법을 받들고, 마지막으로 부처의 제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2 이렇듯 본래 불교에서는 부처·가르침·불제자를 복전이라 한 것이지만, 그렇게 규정하였던 생각의 바탕에 깔린 논리를 조금 확장하여 적용해 보면, 부처와 불제자가 선업을 쌓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된 중생 나아가 사람이 아닌 존재까지 포함하는 모든 중생이 복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선업을 쌓기 위한 밭갈이는 사람이 아닌 존재까지 포함하는 모든 중생을 돕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들을 보면, 복전을 단서로 해서 볼 수 있는 불교사상은 일찌감치 인본주의를 넘어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복덕(福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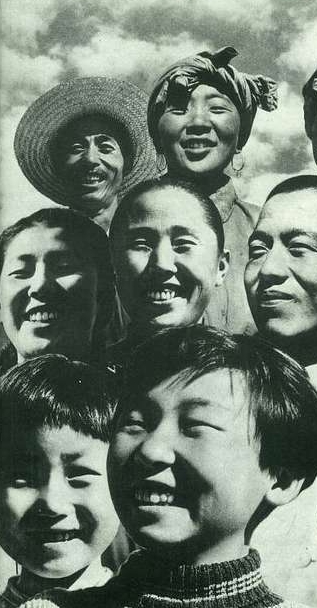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불교적 교양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길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복을 짓는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돕는 일상을 통하여 선한 업을 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면에 주목하면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복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써의 덕과 동일시면서 노력해서 쌓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 타고나는 것도 혼자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붙여 만든 한 단어인 복덕(福德)이라는 말도 복을 타고나는 것으로 보는 생각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국적 전통 속에서 복덕은 공동체 성원들이 서로 나누는 어떤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사회적 틀의 예로 복덕방(福德房)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복덕방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대차·교환을 위한 중개나 대리 사무를 해주는 곳이었다.3 부동산중개업자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덕방의 기원은 고려시대 이후의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라고 한다. 객주와 거간은 다양한 거래들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이때의 거간 가운데 부동산 거래 알선을 주로 활동하는 가거간(家居間)·가쾌(家儈)들이 조전 중기에 이르러 차리기 시작한 사무실에 붙은 이름이 복덕방이었다고 한다. 1900년대 초에 들어서서 부동산 중개 알선업자들은 집주름이라고 불리면서 복덕방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5년부터 매년 국가 공인 시험을 통하여 공인중개사가 세상에 나오면서 그들이 집주름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복덕방은 거의 비유적인 이름으로만 남게 된 듯하다.4
남아있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 복덕방은 밑을 여러 갈래로 가른 누런 삼베를 간판으로 사용하였다. 누런 삼베는 수수해서 복(福)이 잘 붙고 감이 질겨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며, 밑을 여러 갈래로 갈라 놓은 것은 출입하기 편하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그곳은 대체로 노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일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거간노릇을 해주고 댓가로 구전(口錢) 즉 중개수수료를 받는 곳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 업무의 특성이다. 그것은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그 지역의 사정에 관한 정보를 축적한 사람이 맡을 만한 업무였다. 그런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제사나 마을 잔치 등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잡고 여러 정보를 유통시키고, 변화 속도가 지금에 비하여 많이 느렸던 사회에서 연장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생활 요령을 공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는 작은 사회의 소통과 관계맺기의 중심인 곳에 복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때 복덕방은 소통과 관계맺기로부터 복과 덕이 생겨나는[생기복덕(生起福德)] 곳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라면 개인들은 각자 자기의 복을 구하는 것도 소통과 관계맺기를 기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 같다. 이때 덕은 그 소통과 관계맺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복덕이 연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 / eudaimonia)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중시한 개념 에우다이모니아는, 어원적으로 ‘좋은’을 뜻하는 ‘eu’와 ‘정신’ 또는 ‘영혼’을 뜻하는 ‘daimon’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는 ‘좋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 단어는 happiness[행복]이나 welfare[잘 삶] 혹은 flourishing[번성하다] 등으로 영역되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을 넘어, 좋은 운과 신의 축복,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 된 듯하다. 이렇게 보면 덕과 에우다이모니아 양자는 모두 보다 높은 경지를 향한 노력의 결과 축적되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에우다이모니아가 개인이라는 주체를 강조하는 데 비한다면, 복덕의 덕은 그것을 얻고자하는 일개인이 놓여있는 사회적 관계를 명백히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행복(幸福)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복전이나 복덕 같은 말들은 잘 사용되지않고 있다. 해가 바뀔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희귀하다. 복덕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일 듯하다.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말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은 행복(幸福)인 듯하다. 그런데 이 말은 19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어인 행복의 한자어 幸福은 happiness의 번역어이다. happiness의 어원은 ‘행운’ 또는 ‘기회’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어 ‘happ’라고 한다. 이 말과 유사해 보이는 고대 영어 ‘hap’(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혹은 ‘운’을 뜻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파생되었다고 한다; happen[일어나다/(우연히)…이 일어나다]], haphazard[우연히/우연한/우연], haphazard[우연], happenstance[우연한 일]. 그리고 hap에 형용사 어미 ‘-y’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happy는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happy에 접미사 ness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happiness라고 할 수 있다.
1811년 일본에서 나온 어린이 영어 교과서 《諳厄利亜国語和解(암액리아5국어화해)》[전10권] 가운데 제3권에 happiness를 설명하면서 발음은 ヘピネス(헤삐네츠)로 표기하고 뜻은 幸福(행복)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한편, 같은 책 제10권에 다음과 같이 영어 문장 하나와 그것의 일어 번역을 제시하는 대목이 있다.
【영어 문장】 Sir, I Thank you an Eternal friendship and wish you always to simply Fortune, fare well. 【일어 번역】 我汝に生前の交誼恩沢を謝し 常に君の幸福加倍して健在せんことを 祝するなり. 이 대목에서는 영어 단어 fortune을 幸福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1814년 일본에서 나온 영일사전 《諳厄利亜国語林大成(암액리아국어림대성)》에는 happiness·fortune·luck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고 한다; happiness ヘピネス 幸福 / Fortune ホルテュン 幸福 / Luck リュフク 幸. 이 해설이 맞다면, 일본인들은 1811년에 영어 happiness를 幸福이라고 번역하였고, fortune도 幸福이라고 번역하였으며, Luck은 幸이라고 번역한 것이다.6
일본어 번역자는 happiness를 다분히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한 듯한데, 앞서 제시한 happiness의 어원에 관한 설명과 대조하여보면, 이러한 파악은 적확한 것이었다고 해야할 듯하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1895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국민소학독본》 제3과의 다음과 같은 서술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우리가 가족과 같이 상쾌한 집에 사는 것이 참 幸福이라. 다만 그 幸福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상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78 여기에서 행복은 문자그대로 ‘가족과 같이 상쾌한 집에 사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에서 happiness를 번역할 때는 행(幸)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happiness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우연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번역에 적확하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복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처음 사용될 때는 ‘가족과 같이 상쾌한 집에 사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행복이라는 말은 복전·복덕 등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여러 말들 그리고 복이라는 글자 자체도 대신하는 말이 되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다행(多幸)·다복(多福) 같은 말들의 사용 빈도(頻度)도 점차 낮아진 듯하다.
말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한국적 전통에서 복(福)은, 인내심을 가지고 닦아야 각자의 내면에 덕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런 행위자가 속한 공동체 속의 소통과 관계맺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여야 했다. 그러다가 19세기말에 일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행복이라는 말이 복전·복덕·다행·다복 등의 말을 점차 대체하여갔는데, 원래 이 행복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happiness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원어의 뜻을 살려 ‘우연히 생겨났지만 곧 사라지기마련인 순간적인 좋은 삶’이라고 부연설명될 수 있는 뜻을 담보하였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이 번역어를 수입해 쓰면서, 원어 happiness에 함축되었던 우연성을 강조하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행복을 ‘가족과 같이 상쾌한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즐거움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부딧치고있는 복전·복덕·happiness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꽤 많이 다르게 쓰인 행복 등등의 말들의 의미 차이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이루고 누리고자하는 것의 다면성을 생각해보게 하여주었다. 이러한 다면성에 따르면, 행복에는 곧 사라지기마련인 순간적인 것인 면도 있는 것이다. 이런 순간적인 면은 대량파괴와 과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 등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꺼워하는 여러 가지 느낌이 곧 꺼질 촛불처럼 위태로운 것일 뿐임을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위키실록사전》 ‘복전’ [집필: 탁현규] ↩
《위키실록사전》 ‘복전’ [집필: 탁현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덕방(福德房)’ [집필: 김소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복덕방(福德房)’ [집필: 김소임] ↩
조근호, 〈누가 happiness를 행복으로 최초 번역하였는가?〉, 《조근호 변호사의 월요편지》, 2020년 09월 3주차 참조. ‘암액리아’는 영국을 뜻하는 라틴어 Anglia의 일본어식 표기락로 한다. ↩
조근호, 〈누가 happiness를 행복으로 최초 번역하였는가?〉 참조 ↩
조근호, 〈누가 happiness를 행복으로 최초 번역하였는가?〉 참조 ↩
인용된 문장은, 19세기말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 습관에 부합되게 수정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