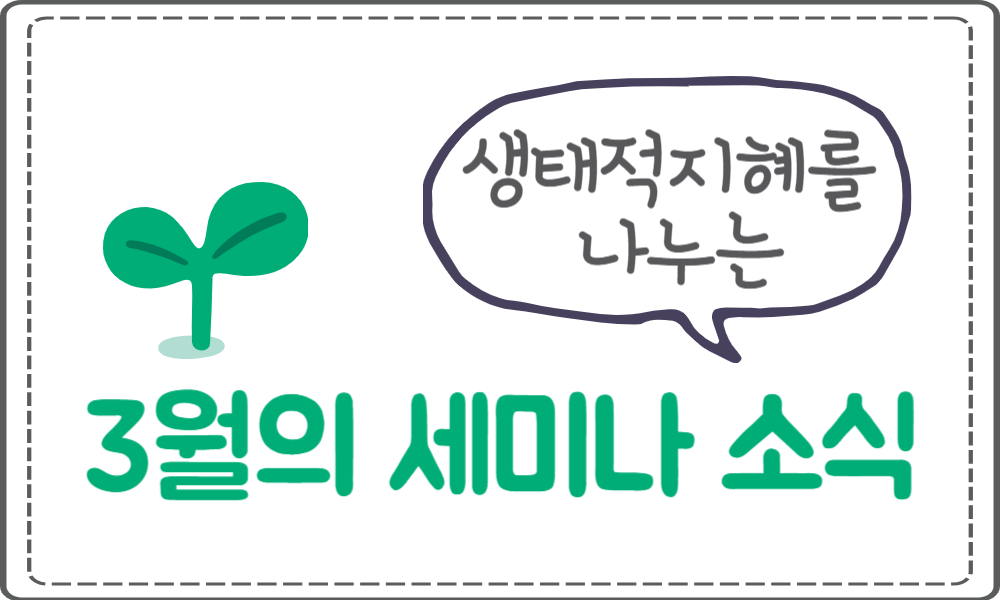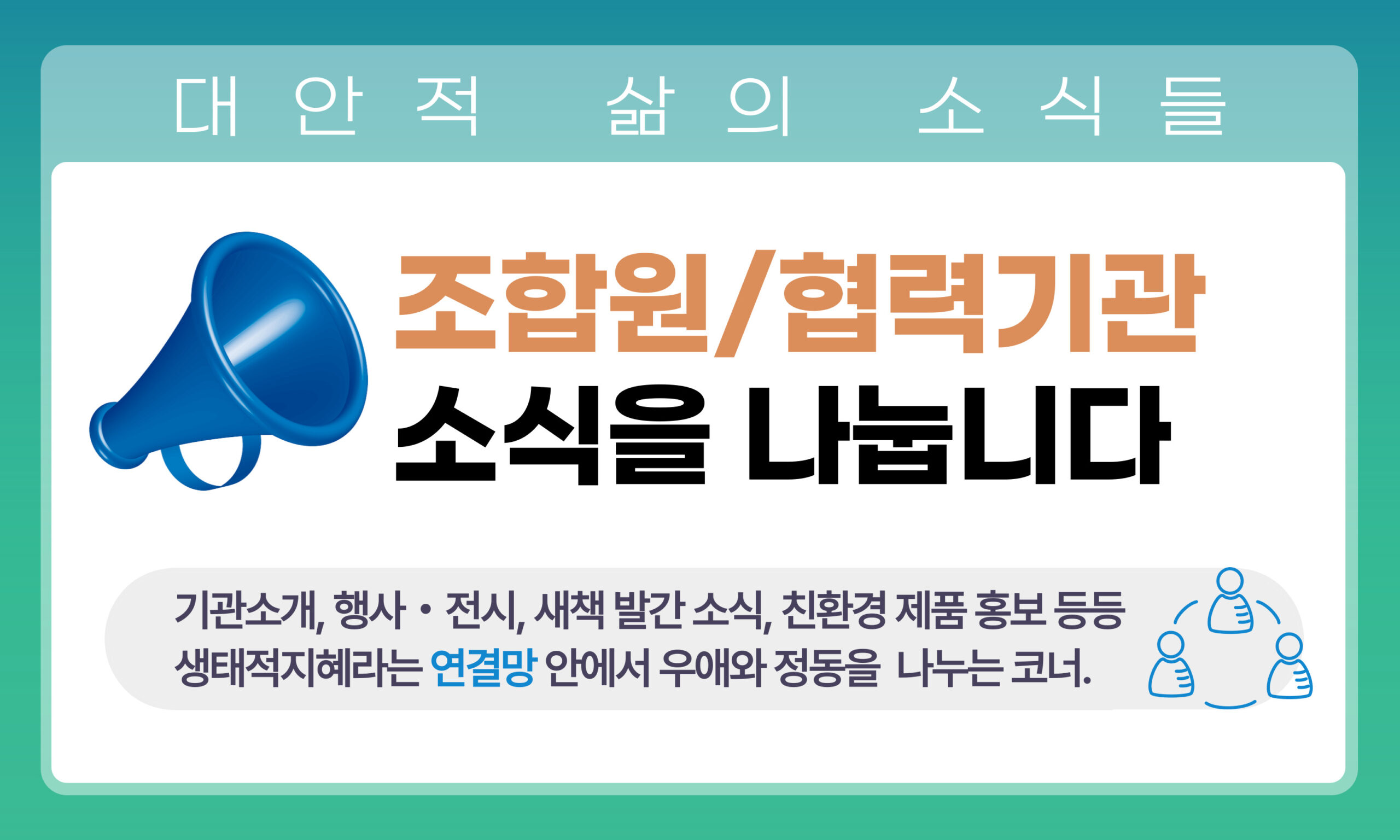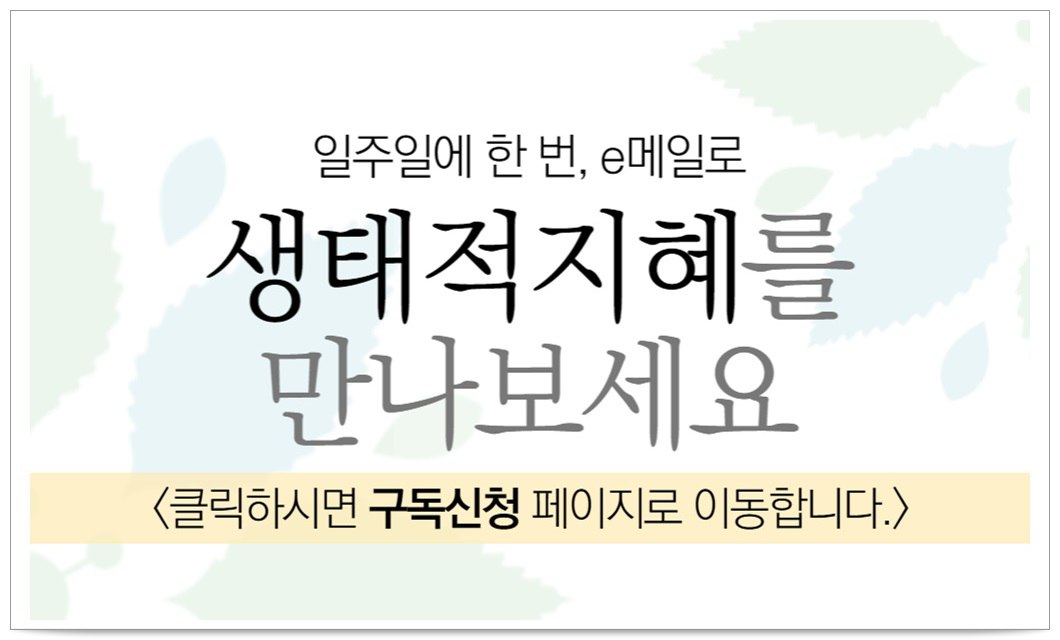기술이 백퍼센트를 결정하는 미래는 없고, 알파고 이후에도 바둑은 계속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면 노동에도 다른 여러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로봇과 AI 도입 이전에,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임금 노동과 생산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편지 한통. 빛바랜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적혀있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김미화 5022번〉 구치소 안에서 받아든 엄마의 편지는, 삼십 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로 내게 쥐어져 있다.
개인의 성공은 사회·자연·역사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순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난소 복권'처럼 타고난 환경과 운의 역할을 인정할 때, 낙오자를 향한 경멸 대신 공감이 생긴다. 따라서 성공한 세대는 부를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대신, 세금·기부·지식 공유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 끊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천편일률적이고 뻔한 생일 축하와 생일축하 노래. 그래서 아내의 생일날 노래만이라도 다른 노래로 축하해 주고 싶어 만든 곡.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건강한 삶을 격려하는 시 한 편.
때론 성공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돌아보며 지나친 것은 없는지, 내가 중요한 만큼 남들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둘러봐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내 안에 담을 내용과 투박하더라도 특별한 이야기가 고이게 된다. 때론 답답하더라도 그 과정을 무던히 견뎌내야만 익어가는 과실을 탐스럽게 마주할 수 있다.
다마금이라는 토종벼가 있습니다. 다마금에 관한 연원을 살피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토종벼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살펴봅니다.
언니의 병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의료의 냉정함과 가족으로서의 무력함을 겪으며 나는 삶이 붕괴되는 시간을 통과한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언니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 스며든 생명 그 자체로 내게 감각된다. 아니 오히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언니의 일부가 아닐까.
진짜 삶의 고수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수록 평범하고도 안 평범하다. 의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수가 아닐까. 바로 나처럼.
펠릭스 가타리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치 철학자, 기호학자, 사회활동가, 시나리오 작가다. 그는 ‘분열분석’을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생태 철학을 개진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건강한 삶을 격려하는 시 한 편.



![[슬기로픈 깜빵생활] ⑤ 엄마의 편지](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20_오피니언_슬기로픈-깜빵생활-⑤-엄마의-편지_사진-main.jpg)

![[월간 김영준_노래 에세이] ② 우주에 단 한 사람](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문화예술_월간-김영준_노래-에세이-②-우주에-단-한-사람_사진-main.jpg)
![[한편의 詩] 모자 쓴 외계인](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20_문화예술_한편의-詩-모자-쓴-외계인_대문사진.jpg)

![[나의 농생태학 실험기] ③ 다마금(多摩錦)을 위한 변론](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오피니언_장흥-농부-이야기③-다마금을-위한-변론_사진-main.jpg)
![[진솔한 몸] ⑦ 그를 만나는 방법](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오피니언_진솔한-몸-⑦-그를-만나는-방법_사진-main.jpg)
![[마을에서 철학하기] ④ 평범하게 안 평범한 평범함](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오피니언_-마을에서-철학하기-④-평범하게-안-평범한-평범함_김진희_대문사진.jpg)
![[생태wiki번역] ㉑ 분열분석과 에코소피(Ecosophy) – 펠릭스 가타리](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해외자료_-생태wiki번역-21-분열분석과-에코소피-펠릭스-가타리_사진-main.jpg)
![[한편의 詩] 꽃 – 고하도 목포학원](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6/02/260205_문화예술_한편의-詩-꽃-고하도-목포학원_사진-mai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