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수가 동의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의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인간 외 동물을 반려로 삼고 보호하고 때로는 도축하고 실험하고 전시하여, 긍정/부정적인 측면으로 존재하는 비인간 동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편의를 위해서 비인간 동물을 이하 ‘동물’이라고 명칭하겠다.)
동시에 동물을 단순히 물건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법적 지위를 명시하여 공평한 위치에 두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그 기저에는 1) 동물을 존엄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사회공동체로 포함할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 2)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증가하며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고려한 까닭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나라별 동물복지 및 동물의 법적 지위는 매우 상이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노력이 커지고 있다. 물론, 동물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 및 인정하는 행위 역시, 인간중심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법령에서 동물보호를 제언함으로써, 과거에는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해 온 종래의 관습은 동물을 인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용하고 때로는 학대를 가해왔지만, 법의 발전 및 개혁을 통해 다소 완화해 가고 있는 추세(송정은, 2022)”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법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정은경, 2009)”으로 작동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항목이 명시되면 동물이 받는 생활의 질과 안전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한 사회가 어떠한 복지정책을 갖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 또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법 · 제도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규범적 틀(박연진, 2019)”이 동물보호법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전 세계는 동물을 법의 주체로 명시하려는 흐름 속에서 동물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기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이름만 보호일까?
한국의 경우,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동물이 갈증이나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동물보호법 제3조) 등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근대법상으로는 타인에 의한 동물의 학대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하 모두를 일컬어 동물영향권자라 한다)에 의한 동물 학대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동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영향권자들에 의한 동물 학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박만평, 2020)되는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그 배경에는 88올림픽 기간, 국외로부터 개 식용을 비판받고 동물 학대가 화두 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언적인 특성이 있었다.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난 후, 부분 개정을 계속해 왔고 현재까지 총 3차례의 전면 개정을 하였다. 크게 바뀐 전면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 첫 번째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서 조문은 12개 조에서 26개 조로 늘어났으며, ··· 동물복지 이념의 중요성이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였다.”(함태성, 2020)고 한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며 반려자의 의무를 강조한 관리에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외에 실험동물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농장동물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 2011년 전부개정 법률에서는 47개 조항으로 이루었다. 큰 변화로는,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피학대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 보호 · 복지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두었다.”(함태성, 2020)고 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농장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다.
– 세 번째, 2022년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55개 조에서 10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국민의 감정을 반영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조항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 ···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처벌 기준도 강화”(박미랑, 2024)하는 등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동물실험 기관에 전임 수의사 배치, 민간 동물보호 시설 신고제 도입 등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들을 편집하였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기존 관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변화를 감행하고 동물보호 강화 및 반려동물 산업을 다루기 시작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추세다.
물건에서 생명체로 – 스페인의 동물보호법 흐름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영토별 규정된 자치법이 있다. 스페인 내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적 조항은 1877년 Palma de Mallorca 시의 시립 조례가 있다. 제206조 “몽둥이, 돌멩이 등으로 개를 학대하는 것은 금지한다.”(CHRISTIAN SANTIAGO VELÁSQUEZ CERÓN, 2023) 하지만, 위 조항에서는 개의 학대만을 금지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 1928년, 왕실칙령 : Royal Decree에서는 “동물과 식물 보호 위원회의 체제와 운영을 위해 삽입된 규정을 승인”(Ministerio de la Gobernación, 1928)하였다고 한다. 최초의 법안은 이러하나 12개의 광역 자치주마다 사법 관련 권한이 있고 동물보호 법안과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법률안을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의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국가 차원의 동물보호 관련 법을 살펴봄에 앞서, 스페인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써 유럽 연합의 동물복지 규정을 전제하에 제/개정되었다. 스페인의 – 형법에서는 1995년 la Ley Orgánica 10/1995에서 처음으로 동물 학대를 경범죄로 벌금형을 취하는 조항이 담겼다. 2003년에는 la Ley Orgánica 15/2003를 제정하여 “가축에 대한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 동물 유기를 경범죄로 도입”(BOE, 2003)하였다고 한다. 이후 la Ley Orgánica 5/2010, la Ley Orgánica 1/2015 법률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여 동물 학대, 성 착취 및 유기 범죄를 전형화하는 현행 337조를 개정”(BOE, 2023)하여 변화해 왔다. 처벌이나 위반에 대한 법적제재가 아닌 동물보호 위주의 법을 살펴보면 – 2007년 행정법에 제정된 법률 La ley 11087/2007가 있다. La ley 32/2007(para el cuidado de los animales, en su explotación, transporte, experimentación y sacrificio)(동물의 착취, 운송, 실험 및 도축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률, 기계번역)은 “동물보호 제도의 기초를 확립하고 착취, 운송, 실험 및 도축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위반 및 처벌의 기초를 설정하는 것”(BOE, 2007)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민법에서는 2021년에 Ley 17/2021 법률을 개정하였다. 리스본 조약(LAW 12533/2007)의 영향을 받아, 정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법을 제333조 제3항, “Los animales son seres vivos dotados de sensibilidad : 동물은 지각을 부여받은 생명체입니다.”(BOE, 2021)로 개정하였다. 감응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동물의 복지/이익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다.
2023년에는 Ley 7/2023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el bienestar de los animales : 동물 권리 및 복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은 “동물 보호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모든 동물을 존중하는 공공 기관과 시민을 포함하는 스페인 영토 전체에 공통 프레임 워크를 수립”(BOE, 2023)”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동물보호를 위한 자문기관/중앙등록제도/공공정책 모니터링/공공 기관의 협력 등을 설명하며 최소한의 규제 설정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은 최소한의 동물보호에서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까지, 동물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 관점을 구현했다. ‘환경과 함께하는 동물보호당’(PACMA)이 있는 만큼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추세이다.
“동물권/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동물보호법에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을 시작점 삼아, 한국과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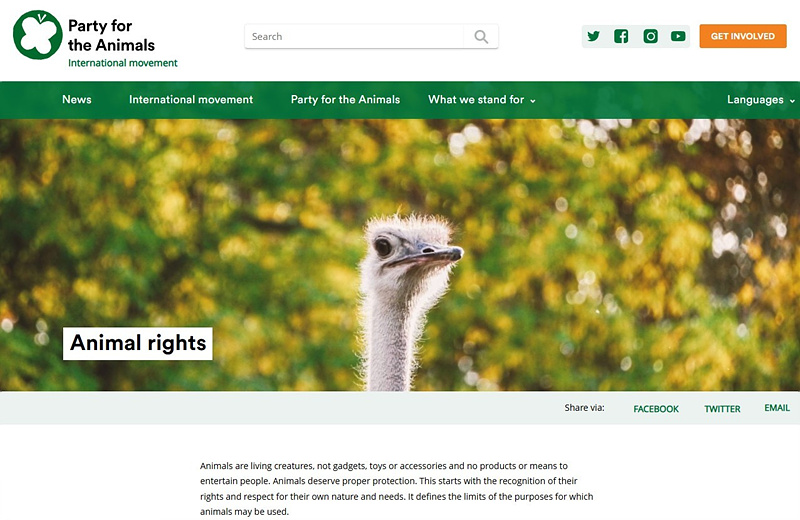
한국에서는 몸보신을 이유로 개 식용을 해왔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개를 먹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늘어남에 따라 2024년 8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최소 1700년대 초반부터, 투우사와의 전투 끝에 소를 그 자리에서 도살하는 투우가 축제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기반 비영리단체인 CAS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우가 금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54%였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22%,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1%였다.”(신은별, 2024)라고 한다. 투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미 카나리아 제도(1991년도에), 카탈루냐주(2012년도에)는 투우를 금지하였다. 스페인의 “투우 소관 부처인 문화부는 지난 5월 투우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일명 ‘국가 투우상'(투우상)을 전격 폐지”(신은별, 2024)하여 지원을 축소하는 추세라 한다.
한국과 스페인은 “전통적”이라고 여겨왔던 문화를 폐지하고 시민의 의식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법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과 한국의 동물보호법 발달 정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각국의 동물보호법과 어떤 상호 관계를 맺는지 스페인과 한국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동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해외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라는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다짐 및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 지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권리’ 또는 ‘주체성’ 문제로 논의가 발전”(한민지, 2021)하듯,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시민들이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두는 정도에 따라 현행법에 동의하는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지지가 법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만평 (2020). “반려동물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학위논문(박사). 1.
박미랑 (2024).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01) 94.
박연진 (2019).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 7개국 동물복지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박사). 1-2.
신은별 (2024, 07, 27). ““소 살해” 비판 커도…스페인 투우 ‘저물 듯 안 저무는’이유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217400004673?did=NA
송정은 (202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사법. 01(59). 274.
정은경 (2009). “사회과에서 법의식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개발”. 성신여자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
한민지 (2022).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 방향 –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87-107.
함태성 (2020).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21(04). 630-631, 633.
CHRISTIAN SANTIAGO VELÁSQUEZ CERÓN (2023) 「Universidad de Valladolid」.
Ministerio de la Gobernación (1928). 「Real decreto de 11 de abril de 1928 aprobando el Reglamento, que se inserta para el régimen y funcionamiento de los Patronatos para la protección de animales y plantas」[1928년 4월 11일 동물 및 식물 보호 위원회의 운영 및 체제를 규정하는 규정을 승인한 왕령]. BOE-A-1928-3787.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28-3787
Ministerio de la Gobernación (1928). 「Real decreto de 11 de abril de 1928 aprobando el Reglamento, que se inserta para el régimen y funcionamiento de los Patronatos para la protección de animales y plantas」[1928년 4월 11일 동물 및 식물 보호 위원회의 운영 및 체제를 규정하는 규정을 승인한 왕령]. BOE-A-1928-3787.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28-3787
Jefatura del Estado (2003). 「Ley Orgánica 15/2003, de 25 de noviembre, por la que
se modifica la 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형법
유기법 1995년 11월 23일자 유기법 10/1995를 개정한 유기법 2003년 11월 25일자 유기법
15/1995]. BOE-A-2003-21538.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03-21538
Jefatura del Estado (2007). 「Ley 32/2007, de 7 de noviembre, para el cuidado de
los animales, en su explotación, transporte, experimentación y sacrificio」[동물보호법
제32/2007호(2007년 11월 7일)는 동물의 착취, 운송, 실험 및 도축에 관한 법률].
BOE-A-2007-19321.
https://boe.es/buscar/act.php?id=BOE-A-2007-19321&b=3&tn=1&p=20071108#a1
Jefatura del Estado (2021). 「Ley 17/2021, de 15 de diciembre, de modificación del
Código Civil, la Ley Hipotecaria y la Ley de Enjuiciamiento Civil, sobre el régimen
jurídico de los animales」[2021년 12월 15일 법률 17/2021은 동물에 대한 법적 제도에 관
한 민법, 담보법, 민사소송법을 개정]. BOE-A-2021-20727.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21-20727
Jefatura del Estado (2023). 「Ley Orgánica 3/2023, de 28 de marzo, de modificación
de la 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en materia de
maltrato animal」. BOE-A-2023-7935.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3-7935
Jefatura del Estado (2023). 「Ley 7/2023, de 28 de marzo,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y el bienestar de los animales」[동물 권리 및 복지 보호에 관한 법률 7/2023,
3월 28일]. BOE-A-2023-7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