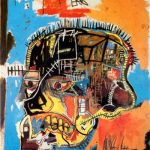‘법무’ 두 글자가 까만 동그라미 안에 세로로 찍혀 있던 하늘색 얇은 모포. 기상을 알리는 소리에 이부자리를 직육면체로 쌓아 올려, 두 글자가 보이게 그 모포로 각 잡아 덮었다. 가끔 ‘법무’ 글자는 뒤집혀 ‘무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혼자 피식 웃었다.
정해진 식사시간,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운동시간, 짧게 허락된 면회 그리고 점호와 취침… 이부자리처럼 각 잡힌 일상이었다. 숨 가쁜 바깥세상에 온통 집중하며 살다가, 처음 강제로 격리된 고립의 시간이기도 했다. 교회 죽순이와 운동권 처자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생활보다 조직생활을 친근하게 느끼게 했기에.
하지만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나에게도, 하루 종일 서로의 화장실 냄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치소 생활은 낯선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차차 적응해가던 차에, 잡지나 책을 외부에서 보내주거나 영치금으로 내부에서 스스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만 외부반입은 검열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렸다. 반갑게도 구치소 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소지’1들이 주말에 카트에 도서관 책들을 싣고 다니며 관내 도서 대여를 권유하기도 했다.

여하튼 ‘이은성’의 세 권짜리 소설 ‘동의보감’ 그리고 1998년에 작고한 ‘최명희’의 ‘혼불’ 그리고 태백산맥 1, 2권이 인상적이었다. 태백산맥을 그 안에서 접하게 된 것은 구치소생활의 대미를 장식할 판결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탁월한 우연이라 할 만하다. 안타깝지만 수형생활의 정석, ‘신영복’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은 건 한참이나 후다. 당연히 양서만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진 않았다. 로맨스소설! ‘하이틴’이나 ‘할리퀸’으로 부르던 그 책자들은 ‘당연히’ 구치소 내의 인기도서였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풍기문란죄로 문제가 되었을 테지만 기필코 암암리에 유통되고 마는 그런 통속소설들.
사실 나의 로맨스 소설 독서이력은 중학교 시절까지로 거슬러 내려가는 것이다. 손바닥만한 그 작고 얇은 것은 교과서로 덮어쓰면 감쪽같았기에,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지루한 수업시간을 커버하기에 충분했다. 참을 수 ‘있는’ 존재의 가벼움! 한 번도 적발된 적 없고 성적이 다소 떨어졌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비행은 지속되었다. 로맨스 소설들은 하나같이 해피엔딩이다. 사랑스럽고도 가증스러운 그것들의 스토리는 의외로 단순했다. 여주인공의 외모는 대체로 넘사벽이며 경제 형편은 어려운 편인데, 소설 구조상 그럴수록 남주의 빵빵한 재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여주의 성격은 둘 중 하나다. 외유내강 캔디형과 수줍은 내향형. 콧대 높고 부자인 경우 여주는 대체로 철부지였고, 사랑의 힘으로 -대체로 주인공들의 동침 후에- 그들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책들 덕분에 구치소의 시간은 잘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피엔딩이 넘쳐나던 책을 덮으니, 검사의 호출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송버스를 타고 검찰청으로 이동해야 했다. 작은 마당으로 호출된 수감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쓸데없이 으르렁대는 남자 교도관 앞으로 두 명씩 줄지어 세워졌다. 유난히 희고 거친 포승줄로 굴비를 엮듯 여러 명을 묶는 데 여념이 없던 그는 “빨리, 빨리!”를 내지르며 “야!” “너!” 등의 거친 언사를 내뱉었다.
“여기는 기결수만 있지 않고, 미결수도 있어요.” 고함은 치지 않았다. 큰소리로 주의를 끌지 않았다. 다만 그가 너무 막 대한다는 느낌이 입 밖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고나 할까. 순간, 거기 묶여 있던 수감자들은 큰 환호성과 “맞네” “그렇지” 하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머쓱해졌는지 혼자 시끄럽던 교도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거칠던 손길도 멈춰졌다.
후에 그 순간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었다. 곱씹어 보곤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기결수든 미결수든 사람을 그리 막 대하면 안 된다고. 살인을 저질러 사형이 정해졌든, 혹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국사범이든, 구치소라는 수감시설은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 말이다. ‘외국인보호소’2 라는 수감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소지’란 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시설 내부의 다양한 잡무 예컨대 식사 배식, 청소, 물품 분배 등을 맡은 수감자를 부르는 말이다. ↩
[오피니언] ‘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경향신문,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