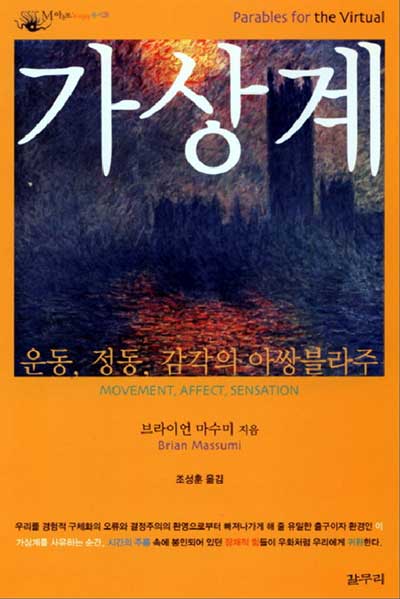
2002년, 듀크 대학교 출판부는,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지금과 그 다음 사이에 끼어들기]라는 기획의 한 부분으로, 브라이언 마수미의 원고를 스탠리 유진 피쉬와 프레드릭 제임슨이 편집한 책 『가상계우화 : 운동, 정동, 감각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을 펴냈다. 이 책은 2011년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assemblage)』라는 제목을 달고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에는, 원서본 제목에 들어가 있던 ‘Parables(우화)’라는 단어가 빠진 대신, ‘얽기(assemblage, 아쌍블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 번역본1의 서문에는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구체적이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아래의 글은 위의 책의 제8장 「낯선 지평」2의 독후기이다.
위상학적 디자인
’위상학적 디자인‘ –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것 혹은 다리가 네 개인 것 따위의 조건을 유지한 채 사물을 다양하게 변형시켜보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런 건 《아기유령 캐스퍼》 같은 만화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감수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물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상상, 가능성의 폭을 넓혀주는 상상이 디자인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감수성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하나의 상징, 하나의 교의, 하나의 취향만 인정하는 정치가 빚는 억압을 디자인을 통해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은 그렇게 다양하다기 보다는 전체주의적인 것에 가깝다. “육체의 공간이 정말로 추상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육체가 위상학적 용어들 말고는 개념화할 수 없는 살아있는 추상(lived abstractness)의 차원들과 분리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낯선」, 308쪽) 라는 마수미의 질문 달리 말하자면 ‘육체의 공간은 위상학적 용어들 말고는 개념화할 수 없는 살아있는 추상의 차원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렇듯 전체주의에 익숙한 일상에 대한 우려와 이어져 있는 듯하다.
6번째 감각, 제6감, 육감?
“사실 육체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조율된 6번째 감각이 존재한다. 바로 자기수용성proprioception이다. 그것은 근육들과 관절들 속에 특수화된 감지기들을 가지고 있다.”(「낯선」, 310쪽)
마수미는 각기 다른 경로와 얼개로 각기 다른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5감 말고 6번째 감각이 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제6감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일상을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향, 즉 방향을 잡는 일과 관련하여 제6감을 설명한다.
“우리가 방향을 잡는 방식은 인식(배열과 더불어 시각적 형태)보다는 굴성(습관과 더불어 경향성)이다.”(「낯선」, 311-312쪽)
어딘가 찾아가는 것을, 5감을 발휘하여 지도와 거리의 각종 안내판을 똑똑히 챙겨보며 방향을 찾아 목적지를 향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은 ‘랜드마크’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조금 헤매다가 결국은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몸에 익는다는 것과 비슷할까.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운동은 더 이상 위치에 맞추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치가 운동으로부터, 운동이 그 자신과 맺는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낯선」, 3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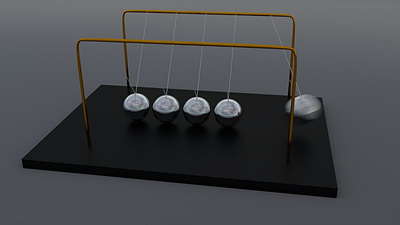
사진출처: ColiN00B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즉 방향을 잡는 일에 빗대어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생활 전반에서 각기 다른 경로와 얼개로 각기 다른 대상으로부터 5감이 느낌을 받는 틀 말고, 제6감이 현실을 구성하는 틀도 있다는 것일까. 여기에서 마수미는, ‘사람의 목표 지향’ 즉, 이동 방식을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운동과 이동 그리고 일상활동을 망라한 사람의 움직임이 가상계인 세계를 있게 하는 틀을 말하는 듯하다. 이런 틀을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부르든 이런 틀이 곧 생활의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주름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작업실로 가거나 나올 때 우리의 몸이 컴퓨터처럼 계산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위상학적 디자인 방식은 디지털로 반복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꾸부정하게 스크린 앞에서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운동으로부터 형태를 추출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부동의 상태로 반복하지 않는가? 우리가 스크린을, 거의 보지 않고, 주시할 때, 우리는 눈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우리 자신이 주름(the fold)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과 그렇게 심하게 다르지 않은 추상적 정향성이라는 육체-차원의 “상실”로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낯선」, 317-318쪽)
이 말은 곧 사람들이 일상에서 위상학적 디자인 방식을 디지털로 반복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반복하며 내면화하게 는 ‘환상’으로 세상을 구성하며,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요구-필요와 욕망-와 결합하면서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상은 요구에 연결된 세계로써 일상적인 행위의 틀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마수미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모든 정향성, 모든 공간화는 위상학적 운동-모든 정향성과 공간화는 이 운동으로부터 무장소 상태nonplace로 파생한다- 안에 실효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낯선」, 318쪽)라고 하였다. 위상학적 운동은 경우의 수가 무한한 물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어딘가를 향한 움직임 즉 일체의 운동 그리고 공간의 점유 그리고 ‘랜드마크’ 같은 것을 단서로 하는 공간 기억의 구성이 위상학적 운동과 결합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마수미에게는 그러한 결합의 결과가 가상계인 세계일 것이다. 마수미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 두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경험의 공간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변형의 위상학적 하이퍼공간이다.”(「낯선」, 318쪽)
“우리는 경험을 되접어야 한다.”(「낯선」, 318쪽)
개체들이 취향에 따라 추는 춤 VS 전체주의

사진출처: geralt
운동과 이동 그리고 일상활동을 망라한 사람의 움직임은, 19세기 이전의 분위기가 묻어있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용어를 사용하여 다시 말한다면 세계는 각자의 의지가 빚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0세기의 유행어를 빌어 다시 말해본다면, 세계는 독립된 개체들의 필요(need)와 욕망(desire)이 충돌하며 변화해 가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21세기적 분위기에 젖어 말해본다면, 개체들이 취향에 따라 추는 춤이 어우러지는 장이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개체들이 취향에 따라 추는 춤이 어우러지는 장이 세계라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장일 것이다. 이런 세계는 2024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마수미가 가상계인 세계를 논하였던 2000년 전후에도 세계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가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게 하여준 요인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이다. 마수미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주요 조건으로 보면서 가상계인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설명에서 그는 현실이 단단한 속성을 가지는 불변의 실체를 원자로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극구 피하려 한 듯하다. 그는 현실이 단단한 속성을 가지는 불변의 실체를 원자로 한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었던 언어(대문자 언어) 사용 방식 또한 피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그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고 흐릿하다. 그리고 그 흐릿한 언어로 세계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곳임을 설파하는 듯하다. 이는 이제 세계가 완전한 자유의 장이 되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유의 이면에 있는 전체주의의 작동을 한사코 억제하여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을 듯하였다. 마수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유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하지만 전체주의를 급속히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마수미는 이 양면성을 모두 주시하고 있었던 듯하다.
2024년 전반기에, 대화형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급격한 발달은 세계 변화의 속도를 급가속시켰다. 2024년 후반기에 들어, 대화형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정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휴머노이드의 발달 속도는 여전히 가속 중인 듯하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대화형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이해에도 깊고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양면성을 모두 주시하였을 마수미는 2024년 12월인 지금도 대화형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급격한 발달이 가진 양면성에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이 책과 그 한국어 번역본의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Massumi, Brian , Fish, Stanley Eugene (EDT) , Jameson, Fredric (EDT), 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02.04.09.〕 브라이언 마수미(지음), 조성훈(옮김),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assemblage)』, 아우또노미아총서 28, 갈무리, 2011.07.30. ↩
이 글에서는 「낯선」으로 줄여 쓰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