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듀크 대학교 출판부는,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지금과 그 다음 사이에 끼어들기]라는 기획의 한 부분으로, 브라이언 마수미의 원고를 스탠리 유진 피쉬와 프레드릭 제임슨이 편집한 책 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 [가상계우화 : 운동, 정동, 감각]을 펴냈다. 이 책은 2011년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assemblage)』라는 제목을 달고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에는, 원서본 제목에 들어가 있던 ‘Parables[우화]’라는 단어가 빠진 대신, ‘얽기[assemblage(아쌍블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 번역본의 서문에는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구체적이다” 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다. 이 책과 그 한국어 번역본의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Massumi, Brian , Fish, Stanley Eugene (EDT) , Jameson, Fredric (EDT), 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02.04.09.〕
브라이언 마수미(지음), 조성훈(옮김),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assemblage)』, 아우또노미아총서 28, 갈무리, 2011.07.30.
아래의 글은 이 책의 제4장 「이성의 진화론적 연금술- 스텔락」1의 독후기다.
기술 낙관주의와 장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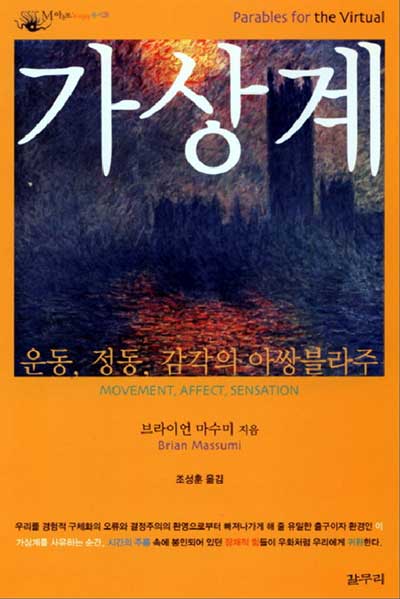
스텔락(Stelarc)2이라는 예명을 쓰는 스텔리오스 아르카디우(Stelios Arcadiou)는, 1946년 6월 19일, 키프로스 리마솔에서 출생하여, 멜버른 교외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The human body is obsolete[신체는 고루하다/인체는 낡았다]”라고 하면서, 인체의 능력 확장에 중점을 둔 행위를 보여준 행위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3 68운동이 일어났을 때 22세였던 그는 1970년대부터 이식 수술, 보철 및 의료 장비, 로봇,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인간 강화(human enhancement)를 시도하였다. 이는 인공적인 진화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신체와 기계장치의 결합으로 인간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이기에 가지는 제약을 넘어서 인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만큼 그의 예술 행위에서 인간은 기계의 부품처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그의 예술 행위들은 기술 낙관주의(Techno-optimism)와 장기주의(Long-termism)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그런 흐름이 형성될 것을 예고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4 그의 예술 행위는 트랜스 휴머니즘(Trans-humanism)과 연결되기 쉽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인간 강화 즉 사람의 정신적・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문화적 운동이다. 장애・고통・질병・노화・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들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생명과학과 신생기술이 그런 조건들을 해결하여 포스트 휴먼(Post-human) 즉 “인간의 주요 능력이 현재의 기준과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 부를 수 없는 미래 인간”5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기대한다. 스텔락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기계를 신체에 장착시켜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스텔락의 예술들은 신체와 기계의 결합, 신체의 내부와 외부의 결합, 신체와 인터넷의 결합 등 ‘결합’을 통해 신체를 확장한다. 마수미는 이 확장을 연장이라고 달리 부르는 듯하다.
스텔락의 행위 예술들
「연금술」을 읽다보면 마수미의 글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수미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속 내적 갈등을 겪어가면서 뭔가를 토로하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마수미의 글은 깨끗하지 않다. 이런 글의 맛은 마수미의 인격과는 무관한 것인 듯하다. 서구에서 꽤 오랫동안 강한 힘을 유지하여 온 형식논리와 합리성에 입각하여 훈련 받았음에도 그것들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마수미 같은 사람으로서는 잘 빚어진 도자기 같이 매끈한 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어주는 것이 스텔락의 행위 예술들인 것 같다. 스텔락의 행위 예술들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마수미의 글을 읽으면 처음 마수미의 글을 읽을 때 느꼈던 어려움이 꽤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스텔락의 행위 예술 몇 경우를 소개할 텐데, 이들 가운데 앞의 두 경우만 「연금술」에 소개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세 경우들을 통하여 「연금술」에서 거듭 강조되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1) 1970년, 곤충의 복안[compound eye]을 기술적으로 로봇의 눈으로 재현하도록 고안된 헬멧[곤충 고글]을 쓰는 행위 예술 〈3번 헬멧 쓰고 걷기[Helmet no. 3: put on and walk]〉를 공연하였다.
(2) 수십 개의 갈고리로 피부를 꿰어 신체를 공중 부양하는 퍼포먼스인 〈피부를 바늘로 꿰어 몸을 띄우기[Body Suspensions with Intentions into The Skin]〉를 공연하였다. 「연금술」 177쪽에 이와 유사한 ‘서스펜션’ 연작 중 하나인 〈Sitting/Swaying:Event for Rock Suspension〉의 사진이 실려 있다.
(3) 연골과 세포로 배양한 인공 귀를 자신의 팔에 이식하여 〈팔 위의 귀[Ear on Arm]〉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2006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스텔락의 대표작이라고 한다. 작품 아이디어는 1996년에 떠올렸지만 실현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의들이 수많은 상의를 거쳐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통해 팔에 귀를 결합했고 세포가 자랐다. 수술 후 귀를 자라게 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호르몬제를 직접 몸에 투여했고,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려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기도 했다. 〈팔 위의 귀〉는 그의 신체 중 일부가 되었다. 스텔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단순히 귀를 이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작은 마이크를 제3의 귀 안에 설치하는 추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원하면 〈팔 위의 귀〉로 접속해 제가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7일 내내 와이파이를 켜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4) 배와 다리 근육에 연결된 로봇팔 〈제3의 손〉을 본인의 오른손에 장착했다. 신체의 근육 운동에 따라 3개의 팔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제3의 손〉 퍼포먼스에서 그는 로봇 팔로 공을 집기도 하고 손목을 290도까지 돌리기도 했다. 스텔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개의 손을 이용해서 ‘EVOLUTION(진화)’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작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였죠. 2개의 눈으로 3개의 팔이 하는 일을 봐야 해서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5) 로봇 다리 6개가 달린 기계 〈엑소스켈레톤(exoskeleton)〉을 타고 스텔락이 직접 조종하였다. 로봇 다리들은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계장치는 영화 《스파이더맨》(1999)에 나온 다리 8개 달린 악당 옥터퍼스와 유사하다. 스텔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의 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며 세상에 적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약하게 디자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 몇 분만 숨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어요. 온도가 단 2~3℃만 변해도 우리는 심각하게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체의 디자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신체에만 순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6
‘소박한 반실재론’
위에 소개한 퍼포먼스들 가운데 ‘(1)’이 「연금술」에 간단히 소개되었다. 마수미는 (1)을 통해서 인식 ‘대상’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행위를 통하여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며, 행위는 필요와 유용함에 의하여 촉발된다고 주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계는 필요와 유용함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마수미는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을 근거로 삼는 듯한 설명을 하였다. 이는 마수미의 철학을 베르그송·시몽동·들뢰즈·가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학자들의 철학사상과도 비교 고찰해 보아야 함을 알려주는 설명 같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들자면, 마수미가 필요·유용성과 욕망을 구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마수미의 편에 서서 양자를 구별하여 보자면 필요·유용성은 비자발적[생리적]인 것인 데 비하여 욕망은 자발적[의지적]인 것으로 대비시켜 볼 수 있을 듯하다. 마수미는 세계라는 것이 몸과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과 같이 ‘안정되어있지 못한’ 영역을 깎아낸[지양(止揚) 내지는 사상(捨相)한] 후에 수립 가능한 관념적 형식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던 것 같다. 베르그송·시몽동·들뢰즈·가따리 등의 철학은 그런 확신의 계기가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마수미의 철학의 성격에 ‘소박한 반실재론’이라는 이름을 붙어볼 수 있을 듯하다. 마수미는 베르그송·시몽동·들뢰즈·가따리 등의 철학에 입각하여 베르그송 이전의 철학에 보이는 인식 주체가 실재한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마수미는 곤충 고글을 써보라고 권고하였다. 이 고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이 곤충이 될 수는 없음에도 그런 권고를 한 까닭은, 필요·유용성이 다른 자들은 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세계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니까 마수미는 각각의 사람이 필요·유용성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체가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수미에게 인식 주체는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실체일 수 없는 것인 듯하다. 이런 면 때문에 마수미는 반실재론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마수미는, 계속 변화하는 인식 주체의 필요·유용성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체 내지는 대상세계는 주체와 무관하게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한 듯하다. 마수미는 연작 퍼포먼스 〈서스펜션〉을 논할 때 중력·인력을 인정하는 등 대상 세계의 실체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주체를 대하는 태도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어 보이고, 대상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해 보인다는 점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수미의 사상에 ‘소박한 반실재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연장– 모든 힘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확장하기
위에 소개한 퍼포먼스들 가운데 ‘(2)’는 「연금술」에 상세히 소개되었다. 수십 개의 갈고리로 피부를 꿰어 신체를 공중 부양하는 퍼포먼스인 〈피부를 바늘로 꿰어 몸을 띄우기[Body Suspensions with Intentions into The Skin]〉의 핵심은 띄우기[Suspension]라고 할 수 있고, 스텔락은 이와 같은 띄우기 퍼포먼스를 여러 번 행하였고, 그것들은 〈서스펜션〉 연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어찌 보면 「연금술」 전체가 〈서스펜션〉에 관한 상세한 해설인 동시에 〈서스펜션〉이라는 ‘우화’를 활용하여 마수미 자신의 세계관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다가 실패한 대신, 상당히 충분히 설명한 흔적 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기본 조건은 외력의 거부인 듯하다. 피부를 바늘로 꿰어 몸을 띄워 놓으면, 몸이 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 연출된다. 실제로 몸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도 예로부터 적지 않은 수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중력을 거부하는 몸짓을 해 왔다. 마수미도 그 뒤를 잇는다고 할 수 있는데, 마침 마수미는 스텔락이라는 예술가의 퍼포먼스인 〈서스펜션〉을 보여주며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통하여 연장(延長)[넓게 폄] 혹은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의 현 단계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최근에 나온 용어로 말하자면, 스텔락의 프로젝트는 소수 minor 과학으로서의 예술을 실행하는 것이다.7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텔락의 퍼포먼스는 지성을 감각의 영-도로 바꾼다. 거기서, 사유는 행동과 결합하고, 몸은 물질과 결합하고, 활성은 비활성과 결합한다. 이들은 결합하자마자 재-전개되고, 여러 갈래로 재-연장하여, 서로 외적이고도 이따금씩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진입한다(그 가능성의 조합과 일치하면서도 교정하는 관계). 부양은 차이 발생의 역-중력 낙하점이다. 물질로부터의 차이 발생. 이것이 진화의 정의이다. 이것이 원형-관념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스텔락의 부양은 진화의 조건들의 인위적 유도 – 가장 전면적인 질적 변형 – 이며, 기교에 의한 그 반복의 리허설이다. 스텔락의 프로젝트는 인간의 몸-대상을 새로운 힘에 대한, 아니면 친숙한 힘의 무시되었던 측면들에 대한 감수성으로 비틀어, 그것을 돌연변이 가능성, 즉 창의적으로 추구되고 실효적으로 연장된다면, 거대한 결과를 불러올 하이퍼 돌연변이 가능성의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다.”8

사진 출처 : Diversicat
이 인용문은 〈서스펜션〉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술」 전체의 주제를 집약해 놓은 문단이라고 볼 수 있다. 마수미는 ‘진화’를 굵은 글씨로 적었고, 스텔락의 부양[몸 띄우기]이 ‘진화의 조건들의 인위적 유도’이며, ‘기교에 의한 그 반복의 리허설’이라고 하였다. 마수미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 진화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본 듯하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상황을 조작하듯, 스텔락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서스펜션〉이라는 퍼포먼스를 설계하여 실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끌어다가, 거기에 빗대어, 진화를 설명하려 한 것이다. 마수미는 중력을 거부하는 모습 즉 자유를 추구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게 펴려 하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반복하여 보여줄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을 듯하다. 스텔락과 마수미는 모두 진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활 영역의 확대를 말하였다. 마수미가 연장이라고 말한 것은 확대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 자유일 것이다. 마수미가 보기에, 자유의 ‘진화’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상치 못하는 역효과와 부작용이 끊이지 않음에도, 쭉 이어지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추상적 사고가 자유와 충돌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유의 확대가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와 함께하여 왔음을 인식할 기회를 잃고, 중력을 거부한 스텔락처럼, 지금 여기에서 허락되고 있는 생활 공간을 넘어 자유를 연장할 수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일 뿐이다. 그리하여 마수미는 이제 「연금술」을 통하여 자유의 진화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려 하였던 것 같다.
자유의지 대 필연성이라는 분기점
한편 마수미와 스텔락이 모든 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것은 당연히 아니다. 앞에서 스텔락의 예술이 기술 낙관주의와 장기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그런 흐름이 형성될 것을 예고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마수미는 어떨까? 이런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연금술」에 보이지는 않는다.
“존재의 두 갈래 양태에 연루된 두 개의 욕망은, 바로 긍정된 탈-인간적 강렬도와 너무도-인간적인 도덕주의이다.”9
「연금술」의 마지막 문장이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텔락은 서슴없이 탈-인간 하고 있다. 그에게는 인간 강화를 통하여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기계를 장착하며 아프거나 멍청하게 생각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인 듯 작업하고 있다. 마수미에게는 이런 색채가 훨씬 덜하다. 스텔락은 자기가 하는 일이 도덕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듯하다. 이에 비하여 마수미는 자신의 사상이 도덕과 유관하다고 보고 있다. 마수미는 과거 도덕과 무관한 것을 도덕과 유관하다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서 비인도적인 짓을 저지르며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윤을 증대시킨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 같다. 스텔락이 일부러 그런 사례들을 조장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관심 1순위는 즐거운 포스트 휴먼 만들기 같다.
이러한 차이는 먼저 자유의지 대 필연성이라는 ‘철학의 근본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텔락과 마수미는 공통되게 자유의지[자유]의 확대를 추구하지만, 스텔락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외력’으로 계산하였던 것 즉 기계장치를 자유의지 구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마수미보다 훨씬 많이 과감하다. 이러하다 보니 필연성에 대한 양자의 생각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듯하다.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필연성의 하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즉 최상위의 도덕규범[maxim]에 대한 양자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다. 스텔락보다 마수미가 이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할 것이다. 아마도 2000년에는 이 차이가 지금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날이 갱신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Conversational A.I. Service]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스텔락과 마수미 모두, 도덕규범부터 시작해서 필연성·자유의지·기술·기계에 대한 생각을 매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이 글에서는 「연금술」로 줄여 쓰겠다. ↩
스텔락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telarc.org/_.php 그리고 유튜브에 스텔락에 관한 아래와 같은 컨텐츠들이 있다.
< Stelarc: The Man with Three Ears> <Transhuman Artist Stelarc I The Feed> <Stelarc – The Body is Obsolete – Contemporary Arts Media>《위키백과(영어)》, ‘Stelarc’ ↩
김진희, 「인간과 기술의 운명을 가늠하는 작가들〉[https://antiegg.kr/19595/] 참조. ↩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Posthumanist Criticism and Science Fiction)〉,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8, vol., no.68, pp. 110-133 (24 pages) 참조. ↩
이 퍼포먼스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박춘호, 〈스텔락은 사상가인가? 과학자인가?〉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86
주단단, 〈예술로 구현한 진화 – 스텔락 Stelarc〉 https://artlecture.com/article/3127
오주현, 〈호주 행위예술가 스텔락〉 https://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4
최형우, 〈스텔락 Stelarc〉 https://artinpost.co.kr/product/artist/887/
김성준,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 작가소개 13 스텔락〉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723
Deleuze and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361~374. 「연금술」, 197쪽, 각주 62. ↩
「연금술」, 197쪽 ↩
「연금술」, 228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