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혜화상탑비(朗慧和尙塔碑), 주변의 특성으로 주변을 찬양하는 수사를 담다
아래 인용문은 낭혜화상탑비라는 비석에 새겨져있는 최치원의 글의 일부의 번역문과 원문이다.
“빛이 왕성하고 충실하여서 천하를 비출 자질이 있는 것으로는 새벽 태양만 한 것이 없고, 기(氣)가 온화하고 융통하여서 만물을 기를 공이 있는 것으로는 봄바람만 한 것이 없다. 큰 바람과 빛나는 태양은 모두 동방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 두 가지의 경사스러움을 모으고 산악이 한줄기 신령한 성정을 내려서, 군자의 나라에 태어나 불교를 우뚝 서도록 하는 사람, 우리 대사가 바로 그분이로다.”1 [光盛且實而有暉八紘之質者莫均乎曉日氣和且融而有孚萬物之功者莫溥乎春風惟俊風與旭日俱東方自出也則天鍾斯二餘慶嶽降于一靈性俾挺生君子國特立梵王家者⎵⎵⎵我大師其人也]2
이 인용문의 번역문 앞 부분은 원문의 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의역도 있다. 【원문】·【직역】·【의역】을 대비하여 보겠다.
【원문】 光盛且實而有暉八紘之質者 莫均乎曉日 氣和且融而有孚萬物之功者 莫溥乎春風 惟俊風與旭日 俱東方自出也
【직역】 빛이 왕성하고 충실하여서 천하를 비출 자질이 있는 것으로는 새벽 태양만 한 것이 없고, 기가 온화하고 융통하여서 만물을 기를 공이 있는 것으로는 봄바람만 한 것이 없다. 큰바람과 빛나는 태양은 모두 동방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의역】 “새벽해가 동방에서 떠오르매 그 빛이 만물에 통하고, 봄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매 그 기운이 세상 끝까지 흡족하다.”3
의역이 지나쳤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글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놓았으니 그런 평가를 받을만도 하다. 그렇지만, 의역이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문을 보고듣기좋게 압축하여 놓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의역과 유사한 투(套)의 말과 글로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를 찬양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듯하다. 그런데, 〈낭혜화상탑비〉라는 비석에 새겨져있는 글 전체는 그런 찬양과는 무관하다. 그 글 전체의 내용은 낭혜화상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참선하는 중들의 인정을 받고 신라로 돌아와 왕들의 존중을 받으며 절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고 다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른바 ‘동방’을 찬양하는 것은 글 앞부분에서 낭혜화상을 찬양할 때 잠깐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 【의역】은 〈낭혜화상탑비〉라는 비석에 새겨져있는 글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그 글 전체의 의미와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약간 가공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낭혜화상탑비라는 비석에 새겨져있는 글에서 최치원은, 동쪽 방향이 해 뜨는 곳임을 바탕으로 신라의 문화를 찬양하였다. 이는 지리적으로 주변이라는 조건을 안은 채, 그 주변성에서 나올 수 있는 특성을 강조하여 특정 주변 문화를 찬양하는 방식의 수사(修辭)[rhetoric]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특성으로 주변을 찬양한 것이다.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 주변의 한 개체 속에 이미 중심성이 들어 있음을 예시하다
아래 인용문은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최치원의 글의 일부의 번역문과 원문이다.
(1) “무릇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나라의 다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동방의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유교를 배울 때에는 반드시 서쪽으로 큰 바다를 건너가 외국어로 배움을 좆았다.”4[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 東人之子, 爲釋ㆍ爲儒, 必也西浮大洋, 重譯從學.]5
위의 원문에서 ‘西浮大洋 重譯從學’을 잘라내고 앞 부분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고, 사람에게는 이방(異邦)이 없으니, 그래서 동인(東人)의 자손들이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6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 東人之子, 爲釋ㆍ爲儒, 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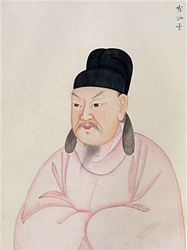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최치원의 글 전체의 내용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참선하는 중들의 인정을 받고 신라로 돌아와 참선을 훌륭히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며 살다 간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낭혜화상이나 진감선사가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는, 바다를 건너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중들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학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며 (1)과 (1)에서 ‘西浮大洋 重譯從學’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번역한 결과인 (2)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들의 뜻을 새겨볼 수 있다.
(1)-1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으며, 그것을 구하려고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 있다.
(2)-1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으며, 동인(東人)들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1)-1은 진리를 구하는 모험을 감행한 사람에 대한 찬양의 일부이다. (1)의 일부를 떼어내서 만든 (2)-1은 동인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임을 강조한다. (2)-1은 (1)의 일부가 아닌 듯하다. 그것은 동인들의 지적·문화적 역량에 대한 확신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2)-1은 (1)과 뜻하는 바가 다른 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2)-1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진리가 시공을 초월한 것이라면 동인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1)에서는 동인(東人)이라는 말이 쓰였다. (1)은 마치, 진리가 초월적이라 하여도, 지역에 살면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맥락 속의 동인은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에 비하여 (2)-1에서는, 누구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니, 동인도 당연히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진리가 초월적인 것이라면 동인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선경은 초치원이 유교 경전인 『중용』에 나오는 “도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축약하여 (1)의 앞머리에 나오는 “무릇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夫道不遠人]” 라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았다.7 그렇다면 도는 멀리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 속 혹은 자기 주변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 속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속에서 도를 구하는 동인은 필연적으로 도, 즉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2)-1을 풀이할 수 있다.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에서, 최치원은 중심성 혹은 보편성은 멀리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 속 혹은 자기 주변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 속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인(東人)은 주변의 하나임에도 그 내부로부터 필연적으로 보편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주변의 한 개체 속에 이미 중심성이 들어 있음을 예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 주변이어야만 진정한 중심이 된다는 논리를 담다
아래 인용문은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최치원의 글의 일부의 번역문과 원문이다.
“오상(五常)을 다섯 방위로 나눔에 동방(東方)에 짝지어진 것을 ‘인(仁)’이라하고, 삼교(三敎)의 명호(名號)를 세움에 정역(淨域)에 나타난 것을 ‘불(佛)’이라 한다. 仁心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능인(能仁)’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다. 해돋는 곳[욱이(郁夷); 신라]8의 유순한 성품의 물줄기를 인도하여,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교해(敎海)에 이르도록 하니, 이는 돌을 물에 던지고 비가 모래를 모으는 것 같이 쉬웠다. 하물며 동방의 제후가 외방(外方)을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처럼 위대함이 없으며, 산천이 영수(靈秀)하여 이미 호생(好生)으로 근본을 삼고 호양(互讓)으로 선무(先務)를 삼았음에랴. 화락한 태평의 봄이요, 은은한 상고(上古)의 교화로다. 게다가 성(姓)마다 석가의 종족에 참여하여, 국왕같은 분이 삭발하기도 하였으며, 언어가 범어(梵語)를 답습하여 혀를 굴리면 불경의 글자가 되었다. 이는 진실로 하늘이 환하게 서쪽으로 돌아보고, 바다가 이끌어 동방으로 흐르게 한 것이니, 마땅히 군자들이 사는 곳에 부처〔법왕(法王)]의 도가 나날이 깊어지고 또 깊어질 것이다.”9[五常分位 配動方者曰仁心, 三敎立名 顯淨域者曰佛. 仁心卽佛 佛目能仁則也. 道郁夷柔順性源 達迦衛慈悲敎海, 寔猶石投水 雨聚沙然. 矧東諸侯之外守者 莫我大, 而地靈旣好生爲本 風俗亦交讓爲主. 熙熙太平之春 隱隱上古之化. 加以姓參釋種 遍頭居寐錦之尊, 語襲梵音 彈舌足多羅之字. 是乃天彰西顧 海引東流, 宜君子之鄕也. 法王之道 日日深又日深矣.]10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최치원의 글 전체의 흐름은 지증대사가 태어나고 수양하고 불자들의 모범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그런 흐름의 앞 단계에 놓여있다. 그런 단계에서 최치원은 지증대사가 태어나고 활동한 신라가 있는 동쪽 방향[동방(東方)/동(東)]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한다.

하나는 해돋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시 종교 관념과 연관되어 있다. 고대의 많은 집단들이 따뜻함과 밝음을 생존과 번영의 기본조건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고대에 한민족들이 이룩했던 정치체들 가운데 하나였던 신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식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신라 형성 초기의 이름이자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도를 부른 이름이었던 ‘새벌’ 혹은 ‘서라벌’은 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말로써, 그러한 흔적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민족들만 가졌던 생각이 아니었던 듯하다. 한민족들에게 감염되어서였든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였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동방을 해돋는 곳으로 중시하는 사고관념이 유통되었던 듯하다. 고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 공안국은 유교 경전인 『상서』를 해설하면서 욱이(郁夷)를 ‘동쪽 끝’이라고 설명한 것이 그에 대한 방증(傍證)이 될만하다. 따라서, 한민족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집단들 사이에서, 동쪽 방향의 성격을 따뜻함과 밝음 나아가 새로움과 깨끗함까지 함의하게되는 해돋는 곳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의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한민족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쪽 방향을 어짊[인(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범엽(范曄)[398~445]은 『후한서』〈동이열전〉네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동방을 이(夷)라 한다. 이(夷)는 뿌리로서, 어질어서[인(仁)] 살리기를 좋아하니 만물이 땅에 뿌리박고 자라남을 말한다. 그러므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써 다스리기 쉬워 군자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게 되었다.”11
노간(勞幹)은 그의 책 『중국문화논집』에서 “우리들(중국인)은 동방사람을 동이(東夷)라 부르는데, 이(夷)자와 인(人)자는 통용되며, 인(人)자와 인(仁)자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인(人)이라 일컫는 것은 그 근원이 동방(東方)에서 나왔다”라 쓰고 있다.12 이런 주장들이 맞다면 동이(東夷)는 동인(東人)과 같으며 어짊은 동쪽 방향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 된다. 중국 역사 속에서 이(夷)로 지칭된 집단은 여럿이었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산동반도와 산해관 북부에 분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범엽이나 노간의 논리에 근거하여 동이와한민족을 동일시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선경은 최치원이 이러한 동이 설명들을 신라인의 이야기로 흡수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3 말하자면 이는, 동이(東夷)가 중국 역사지리에 등장하는 여러 이(夷)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중국사상사에서 어짊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어온 이(夷) 자체는 아니었던 것을, 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던 동이(東夷)에게, 동쪽 방향과 어짊[인(仁)]을 동일시하는 단편적 기록들을 연결시켜서, 어짊[인(仁)]을 동이(東夷) 혹은 동인(東人)의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치원은 동쪽 방향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하나는 해돋는 곳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방향을 어짊[인(仁)]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경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한다.
“『주역』의 복괘(復卦)[䷗]는 동지(冬至) 아침을 상징하는 괘이다. 가장 긴 밤을 지내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첫 시작의 순간이다. 은미하게 새 생명이 태동한 그 엄숙한 시간을 기리기 위해 옛날에는 동짓날 성문도 닫고 왕래하지 않으며, 임금도 정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름에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복괘는 말한다. 하늘과 땅의 마음이란 다름 아닌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인(仁)의 마음이다.”14
여기에는, 동쪽 방향임에도 어진 것이 아니라, 동쪽 방향이기 때문에 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지(冬至)의 가장 길고 추운 밤을 지낸 끝이었기에, 이튿날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더 따뜻하고 밝고 새롭다고 하는 논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추운 밤을 넘기고 맞이하는 아침임에도 밝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추운 밤을 넘기고 맞이하는 아침이어야만 밝음과 따뜻함의 소중함이 절실한 것이라는 식의 역설(逆說)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역설은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운동의 방향이 반전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극즉반(極則反) 혹은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라는 주역의 이치[역리(易理)]와 다름이 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이치에 따르면, 동쪽 방향이라는 주변성이 극단화될수록, 해 뜨는 곳 혹은 뜨는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는 특성이 더 선명하여지고, 뭇 생명을 살리는 따뜻함과 밝음도 강하여질 것이다.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라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에서 최치원은, 주변이어야만 진정한 중심이 된다는 논리를 담은 셈이다. 이 논리는 열려있어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심이 된 주변은 또다른 주변에게 중심의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언젠가 다시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밤과 낮이 계속 바뀌고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이 이러한 중심-주변 순환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주변은 주변이고 중심은 중심일 뿐이라는 고착된 사고는 곧 바스러져버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리를 정리하다보니, 2024년 동짓날인 12월 21일 밤에서 22일에 걸쳐 남태령에서 펼쳐졌던 연대와 결집이 떠올랐다. 그때 경찰은 길 양쪽 끝을 막아 혹독한 추위 속에 사람들을 방치하였다. 추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날씨였는데도 경찰은 그렇게 하였다. 경찰은 경찰이 농민을 이기는 ‘법칙’을 굳게 믿었던 듯하다. 그런 믿음은 사람의 목숨을 아랑곳 하지 않는 처사를 성찰할 수 있는 감각을 무디게 하였을 것이다. 그 사이 거기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각각으로는 주변적이며 특수한 개체들임에도 각각의 내면에서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공통성을 찾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그들은, 남태령에서의 집화가 화제가 되고, 연이어 전개된 눈 내리는 한남동에서의 연좌가 화제가 되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변화하여 갔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남동신(역주),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保寧 聖住寺址 朗慧和尙塔碑) [국역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사료 DB | 금석문·문자자료]》 ↩
남동신(판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사료 DB | 금석문·문자자료]》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해설, 최치원의 문장과 글씨를 볼수 있어요〉, 《뉴스인팩트》, 2021-06-09 ↩
최연식(판독),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河東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원문 표점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사료 DB | 금석문·문자자료]》 ↩
유교경전연구가 공안국은 『상서』를 해설하면서 욱이를 ‘동쪽 끝’이라고 설명하였다고한다. ↩
南東信(解釋),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解釋文]〉,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사료 DB | 금석문·문자자료]》 ↩
南東信(判讀),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判讀文]〉,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사료 DB | 금석문·문자자료]》 ↩
이선경, 〈해치기보다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심정 | 벗님글방》, 2022-11-26에서 재인용 ↩
이선경, 〈해치기보다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심정 | 벗님글방》, 2022-11-26에서 재인용 ↩
이선경, 〈해치기보다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심정 | 벗님글방》, 2022-11-26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