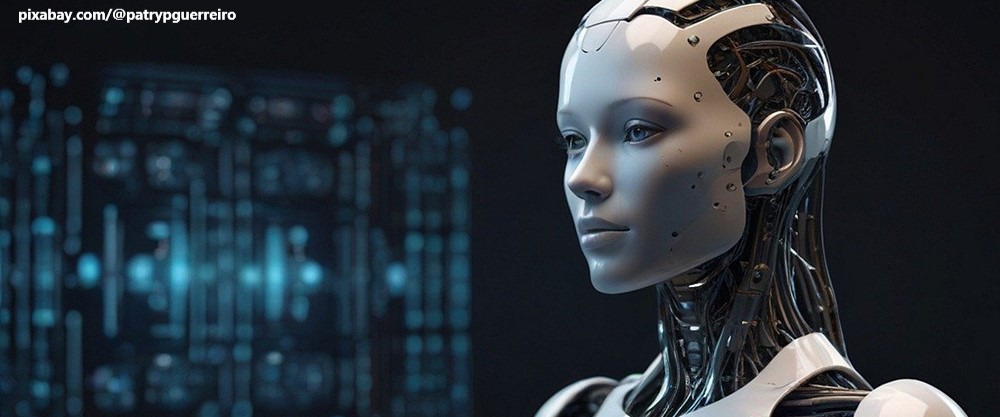| •출생 도나 잔느 해러웨이 1944년 9월 6일 •배우자 제이 멜러 (이혼), 러스틴 호그니스 (1975년 결혼) •수상 존 데스먼드 버널상, 루드비크 프렉상, 로버트 K. 머튼상, 윌버 크로스 메달 •학력 예일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영향을 준 인물 낸시 하트삭, 샌드라 하딩, G. 에블린 허친슨, 로버트 영, 그레고리 베이트슨 •학업 분야 동물학, 생물학, 과학 및 정치, 기술, 페미니스트 이론, 의학 연구, 동물 연구, 동물-인간 관계 •주요 관심사 페미니즘 연구, 에코페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주목할 만한 연구 사이보그 선언문, 영장류의 비전: 현대 과학 세계의 젠더, 인종, 자연, 문제를 안고 가기, “상황에 맞는 지식: 페미니즘의 과학 문제와 부분적 관점의 특권” •주목할 만한 생각 사이보그, 사이보그 페미니즘(사이보그 선언문), 사이보그 이미저리, 영장류학, 종간 사회성 |
1. 도나 해러웨이
도나 J. 해러웨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의식사(意識史) 및 페미니즘 학부의 명예교수로, 과학과 기술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다. 그녀는 또한 정보 기술과 페미니즘 이론의 교차에 기여하였고, 현대의 에코페미니즘을 학문적으로 선도한다. 그녀의 연구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비인간적 과정들의 자기조직화하는 힘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비인간적 과정들과 문화적 실천 간의 불협화음의 관계를 탐구하며 윤리의 근원을 재사유한다.

해러웨이는 하와이 대학(1971 – 1974)과 존스 홉킨스 대학(1974 – 1980)에서 여성학과 과학사(科學史)를 가르쳤다. 그녀는 1980년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미국 최초의 페미니즘 이론 종신 교수가 되었다. 해러웨이의 작업은 인간-기계 관계 및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여했다. 그녀의 업적은 영장류학, 철학, 발달생물학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해러웨이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린 랜돌프(Lyn Randolph)와 협력적으로 교류했다. 그들은 페미니즘, 기술과학, 정치 의식 및 기타 사회적 쟁점에 관한 특정한 생각들을 다뤘으며, 이는 해러웨이의 책 『겸손한 목격자』의 이미지와 서사를 형성했다. 그녀는 『겸손한 목격자』로 1999년 〈과학사회학 학회〉로부터 ‘루드비크 프렉상’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1992년 『영장류의 시각: 근대 과학의 세계에서 젠더, 인종, 자연』으로 ‘로버트 K. 머튼상’의 과학, 지식 및 기술 부문을 수상했다. 해러웨이는 2017년 예일대 동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상인 ‘윌버 크로스 메달’을 수상했다.
2. 생애
유년 시절
도나 해러웨이는 1944년 9월 6일에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프랭크 O. 해러웨이는 〈덴버 포스트〉(The Denver Post)의 스포츠 기자였고, 어머니 도로시 맥과이어 해러웨이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 해러웨이가 16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해러웨이는 콜로라도주의 체리 힐스 빌리지의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에 다녔다. 비록 지금은 가톨릭 교도는 아니지만 유년시절 수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영성체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녀가 비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교육
해러웨이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했고, 철학과 영문학을 부전공했으며, 전액 장학금인 보에처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해러웨이는 파리로 유학을 가 테야르 드 샤르댕 재단으로부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진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또한 그녀는 1972년 예일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위논문 「조직화 관계에 대한 탐구: 20세기 발달생물학의 유기체 패러다임」은 실험생물학에서 실험할 때 은유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다룬다. 그녀의 이 논문은 이후 편집을 거쳐 『수정체, 직물 그리고 장: 20세기 발달생물학에서 유기체의 은유』로 출판되었다.
이후 활동
해러웨이는 여러 장학금을 받았다. 1999년 해러웨이는 〈과학사회학 학회〉로부터 ‘루드비크 프렉상’을 받았다. 2000년 9월 해러웨이는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받아 〈과학사회학 학회〉 최고 명예상인 ‘J.D. 버널상’을 수상했다. 1985년에 출판된 해러웨이의 가장 유명한 글 「사이보그 선언: 1980년대의 과학, 기술,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사회주의, 유물론에 충실한 아이러니한 정치적 신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해러웨이는 논문 「상황적 지식: 페미니즘의 과학문제와 부분적 관점의 특권」(1988)에서 ‘과학적 객관성’의 신화를 폭로하고자 했다.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을 ‘모든 지식이 위치적 관점(positional perspectives)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우리의 위치성이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심 대상에 관한 앎[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황적 지식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설명능력(accountability)이 없다면, 연구자 공동체의 암묵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토대 진리'(ground truth)―사람들은 이로부터 가정과 가설을 구축한다―인 것처럼 왜곡된다. 「상황적 지식」에서 해러웨이가 제시한 생각은 낸시 하트삭(Nancy Hartsock)과 여타 페미니스트 철학자 및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책 『영장류의 시각: 근대 과학의 세계에서 젠더, 인종, 자연』(1989)은 영장류 연구에 비판적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서 이성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영장류학에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해러웨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의식사(意識史) 및 페미니즘 학부의 그녀는 파트너인 러스틴 호그니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 해러웨이는 집단적 사고와 모든 관점을 자신의 작업에 통합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저는 제가 백인만 인용한 것은 아닌지, 원주민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비인간 존재를 잊은 것은 아닌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저는 좀 올드하고 어설픈 범주들을 들여다 봅니다. 인종, 섹스, 계급, 지역, 섹슈얼리티, 젠더, 종 등을 말이죠. … 저는 이 모든 범주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지만, 이 범주들은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요 주제
「사이보그 선언」
1985년 해러웨이는 『사회주의 리뷰』에 「사이보그 선언: 1980년대의 과학, 기술,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발표했다. 해러웨이의 초기작 대부분은 과학-문화의 남성적 편견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저작은 20세기 페미니즘 서사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사이보그 선언」은 1980년대 미국에서 부상하던 보수주의에 응답한 것으로, 당시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해러웨이가 “지배의 정보학”이라고 부른 것 안에 여성이 ‘위치지어진 상황'(situatedness)을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걸려있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특권화된 이항논리의 위계를 따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헤게모니에 깊이 스며들어 그에 착취당하면서도 그와 공모했으며,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를 그 자체로 형성해야 했다.
사이보그 페미니즘
기존의 글을 증편한 「사이보그 선언: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글은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1991)에 수록되었다―에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은유를 사용해 페미니즘 이론과 정체성 간의 근본적 모순이 왜 해소되기보다는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는 사이보그 안에서 기계와 유기체가 융합되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 선언문은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중요한 페미니즘적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남성들이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착취하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완전한 평등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다는 점을 밝힌다.
『영장류의 시각』
해러웨이는 또한 과학과 생물학의 역사에 대해 글을 썼다. 그녀는 『영장류의 시각: 근대 과학의 세계에서 젠더, 인종, 자연』(1990)에서 영장류학을 이끄는 은유와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영장류학에는 이야기를 남성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적인 수컷과 수용적인 암컷 간에 이뤄지는 생식 경쟁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몇몇 유형의 결론을 촉진하고 다른 유형의 결론은 배제한다 “고 주장한다. 그녀는 여성 영장류학자들이 더 많은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생존 활동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관찰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매우 다른 자연과 문화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서구적인 서사 및 이데올로기의 사례를 들면서 해러웨이는 영장류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인간-자연 이야기를 다룬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장류의 시각: 근대 과학의 세계에서 젠더, 인종, 자연』에서 그녀가 말하길,
내가 바라는 것은, 늘 비스듬하지만 때로는 왜곡된 초점 맞추기가 차이-특히 인종적 차이와 성적 차이-를 다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서구적 서사의 수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생식 특히 생식하는 자와 그 자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생식’과 ‘생존 특히 역사의 기원과 종말 둘 다를 경계짓는 조건에서 상상된 생존’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구적 전통을 따르는 복잡한 장르 내에서 이야기되었다.
과학을 다루며 해러웨이가 겨냥하는 것은 “과학의 ‘객관성’의 한계 및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최근에 페미니스트 영장류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수정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이데올로기들은 과학의 인간-자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계속해서 틀지어왔다. 해러웨이는 페미니스트들이 기술과학의 세계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의 공로를 인정받을 것을 촉구한다. 1997년에 출간된 책 『겸손한 목격자』 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들이 기술과학적 세계-건설하기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의미 형성에 더욱 빽빽이 이름을 올리기를 바란다. 나는 또한 기술과학적 실천과 기술과학 연구 모두와 관련해 페미니즘을 성격규정하는(혹은 성격규정하지 못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활동가, 문화 생산자, 엔지니어, 학자(및 중첩되는 모든 범주들)-이 우리가 과학기술 내에서 줄곧 해왔던 접붙이기와 명부등록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구가 아니라 친족을 만들자: 세대를 다시 구상하기』
해러웨이는 2015년에 다른 페미니스트 사상가 5명과 함께 “아기가 아니라 친족을 만들자”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체가 중점을 두는 것은 환경, 인종, 계급과 같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간의 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었다. 해러웨이의 핵심 문구는 “아이를 만드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유년시절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이다. 그녀와 다른 협의체 일원인 아델 클라크(Adele Clarke)는 이후 협의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인구가 아니라 친족을 만들자: 세대를 다시 구상하기』을 출판했다.
사변적 우화
사변적 우화는 해러웨이의 여러 저작에 포함된 개념이다. 사변적 우화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야생의 사실 일체를 포함하며, 창조성의 양식과 인류세의 이야기를 지시한다. 해러웨이는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강조한다. 『트러블과 함께하기』 에서 그녀는 사변적 우화를 “주의의 양식, 역사 이론, 세계짓기의 실천”으로 정의하고 이를 학술 저술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 해러웨이는 자신의 작업에서 페미니즘의 사변적 우화와 모든 아동의 좋은 유년시절을 보장하고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아기 대신 친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구가 아니라 친족을 만들자: 세대를 다시 구상하기』는 이 이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 제안을 강조한다.
『반려종 선언: 개, 사람 그리고 소중한 타자성』
반려종 선언은 “개인적인 문서”로 읽혀야 한다. 이 저작은 동거, 공진화, 신체화된 교차-종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쓰였다. 해러웨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개와 맺는 ‘동반(반려)’ 관계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과 ‘소중한 타자성에 참여할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인간과 개와 같은 동물 간의 연결은 사람들에게 다른 인간 및 비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해러웨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반려 동물” 대신 “반려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관계를 그들과 맺기 때문이다.
4. 해러웨이에 대한 비판적 반응
해러웨이의 작업은 “방법론적으로 모호하고, 때때로 명백히 의도적인 방식으로 숨겨진” 두드러지게 불분명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러 평론가들은 그녀의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럽고 그녀의 인식론 탐구가 때때로 그녀의 텍스트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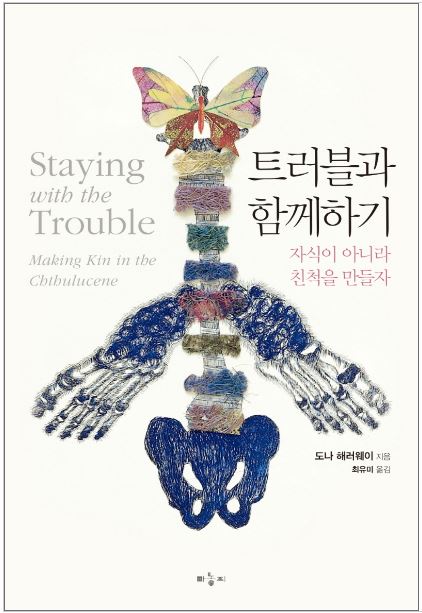
1991년 『국제 영장류학 저널』에 실린 해러웨이의 『영장류의 시각』에 대한 서평은 그녀의 과학관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 중 일부를 제시하며, 1990년 『미국 영장류학 저널』에 실린 서평도 그와 비슷하게 그녀를 무시하는 논평을 담았다. 『생물학 역사 저널』에 실린 서평에서, 성(性)과학자 앤 파우스토-스털링(Anne Fausto-Sterling) ―그녀는 젠더의 사회적 구성,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 젠더 역할, 간성(間性)에 관해 광범위한 글을 썼다―은 “읽기가 더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영장류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2017년 『아트리뷰』 는 해러웨이를 현대 예술계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면서 그녀의 작업이 “예술계 DNA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5. 출판물
• Crystals, Fabrics, and Fields: Metaphors of Organicism in Twentieth-Century Developmental Bi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Primate Visions: Gender, Race, and Nature in the World of Modern Science,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1989.
•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and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1991(includes”ACyborgManifesto”). [한글본]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황희선, 임옥희 옮김, 아르테, 2023
• Modest_Witness@Second_Millennium.FemaleMan©Meets_OncoMouse™: Feminism and Technoscience, New York: Routledge, 1997 (winner of the Ludwik Fleck Prize) [한글본] 『겸손한 목격자』,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7
• How Like a Leaf: A Conversation with Donna J. Haraway, Thyrza Nichols Goodeve,NewYork:Routledge,1999 [한글본] 『한 장의 잎사귀처럼』, 민경숙 옮김, 2005
•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2003. [한글본]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에 「사이보그 선언」과 함께 수록됨.
• When Species Me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한글본] 『종과 종이 만날 때』, 최유미 옮김, 갈무리, 2022
• The Haraway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Durham:DukeUniversityPress,2016. [한글본]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 Manifestly Harawa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한글본]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 Making Kin not Population: Reconceiving Generations, Donna J. Haraway and Adele Clarke,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