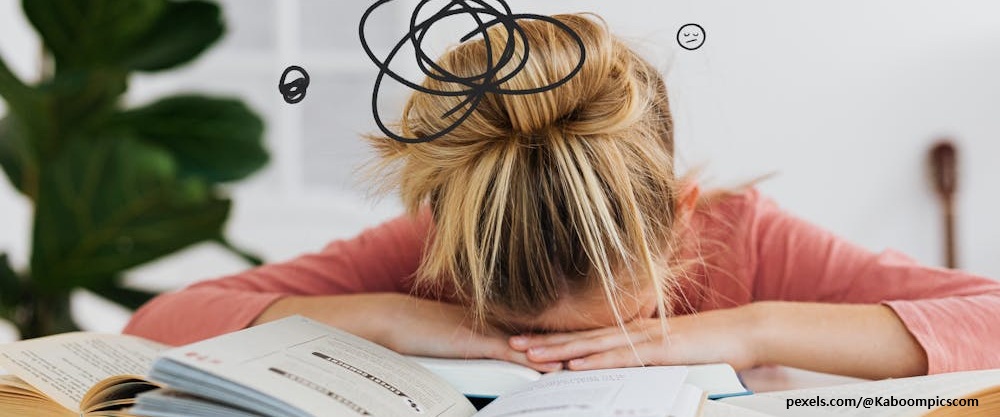공부(工夫/gōngfu/Gongfu))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공부(工夫)를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배우고 익힘”은 학습(學習)이라는 말로 갈음할 수 있다.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학’과 ‘습’ 두 글자가 여기에 나오니, 학습이라는 말이 생겨나서 널리 쓰이고 있는 현상은 『논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공부(工夫)라는 말이 쓰인 예를 찾다보면 불교 선종(禪宗)에서 쓰였던 ‘공부하다[做工夫]’라는 말을 만날 수 있다.1 불교 선종에 속한 종교인들은 선 수행을 하였다. 그런 그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선 수행을 한다는 것이었을 듯하다. 중국에서 불교 선종이 유행하고 전개한 후 생겨난 주자학에서도 공부라는 말을 썼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을 때, 성현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學者讀書, 須要將聖賢言語, 體之於身” [『論語孟子讀法』]
(2) 남들이 나를 믿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서는 아니되는 공부이며,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謹信存誠裏面工夫, 無跡 [『朱子語類』]”
(3) 공부의 각 조목을 상세히 논한다. “細論條目工夫 [『大學章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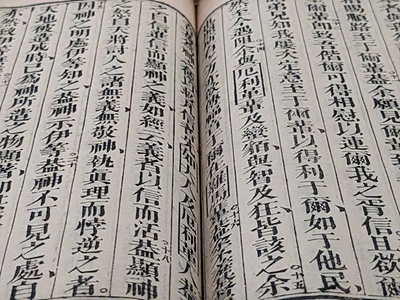
사진 출처 : Alex Ip
(1)은 공부에 대한 정이(程頤)[1033~1107]의 설명을 주희(朱熹)[1130~1200]가 되풀이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압축하여 공부라는 말을 개념으로 정의하여보면 “자취를 남기지 않은 내면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2)는 주희가 제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공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 제자가 글 읽는 데에만 치중한다고 보았던지, 주희는 책만 읽는 그 제자에게, “남들이 나를 믿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비가시적’인 목표를 권함으로써 일종의 균형잡기를 시도한 듯하다. 주희가 제자들에게 권할만했던 것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타에 모범이 되기, 정계에 나가 정의를 실현하기, 유교 경전을 연구하기, 역사를 거울삼아 현실 정치를 논하기, 시를 지어 포부와 소회를 세상에 알리고 남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주희의 말은 달라졌다고 한다. 주희는, 이를테면 TPO 즉 Time[시간]·Place[장소]·Occasion[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장하도록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자의 행적에서도 볼 수 있었던, 중국 전통의 스승-제자 관계[사승(師承) 관계]의 한 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 스승-제자 관계가 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에도 영향을 주어 선종이 스승-제자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주자학에 자극을 주어 주자학에서도 스승-제자 관계가 재점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한편, (3)에서 볼 수 있듯, 주희는 공부라는 것이 상세히 논하여야 할 조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의 8조목을 따라 해나가야 하는 이른바 ‘큰 사람이 해야 하는 학문[대인지학(大人之學)]으로 구성된 『대학(大學)』을 해설하면서 적어놓은 것이다. (2)를 보면 주희가 생각하는 공부는 겉으로 드러내서는 아니되며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인 듯하다. (3)을 보면 주희가 생각하는 공부는 조목으로 나뉠 수 있는 것 혹은 조목들의 조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 듯하다. (2)와 (3)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주희가 생각하는 공부는, 가시적 목표와 비가시적 목표 사이의, 달리 말하자면 이질적인 요소들 사이의 부정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같아 보이기도 한다. 마음을 닦고 마음의 힘을 기른다[수양(修養)]는 비가시적 목표와 그러한 마음을 갖추고 세상에 나가 어지러움을 가지런히 정리한다[경세(經世)]는 가시적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서 그 내부에 부정합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공부는 13세기 이전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되었으며, 19세기말 까지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에서 중시되었던 행위 지침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부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는 위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 듯하다. 20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동북아시아는 크고 강한 학습(學習) 사회라 할 수 있고, 공부와 학습은 영어로는 모두 스터디(study)라고 번역되고 있건만, 20세기부터는 동북아시아에서 공부라는 말이 주희가 사용하였던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쿵푸/쿵후(功夫/Kung-fu/Kungfu)
20세기 접어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공부(工夫)라는 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진 데 비하여, 서구에서는 공부(功夫)라는 말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한자로 工夫(공부)라고 쓰는 말과 功夫(공부)라고 쓰는 말의 발음은 모두 gōngfu라고 표음된다. 한글로는 ‘공푸’ 정도로 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20세기 초 서구에 퍼질 때부터 Kung-fu 혹은 Kungfu라고 표음되었다. 한글로는 ‘쿵푸’ 혹은 ‘쿵후’로 표음되었다. ‘쿵푸’는 功夫(공부)의 광둥어[광동화(廣東話)] 발음이라고 한다. 20세기 초에 서구가 중국과 주로 교류하던 지역이 홍콩, 마카오 등의 남부 지방이다 보니,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功夫(공부)의 광둥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음한 결과인 Kung-fu가 功夫(공부)를 연원으로 하는 외래어로 서구에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功夫(공부)를 ‘공푸’라고 표음하기보다는 ‘쿵푸’ 혹은 ‘쿵후’라고 표음하게 된 듯하다.2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Illustrated Fiction Magazine』이라는 지면에 소설 『노자 여행기(The Travels of Lao Ts’an)』가 연재되었다. 여기에 보리달마가 소림사에 무술을 전수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었다고 하고, 그 무술이 쿵푸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쿵푸라는 무술을 둘러싼 ‘통속적인 신화’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보리달마(菩提達磨)[보디다르마]는 중국에 불교를 전한 인도의 승려로, 중국 선종의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그를 중국 선종 제1대 조사(祖師)라고 한다. 그는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좌선하였다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달마도(達磨圖)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소림사로 무술을 들여왔다는 설이 『역근경(易筋經)』이라는 책에 실려 있긴 하지만, 19세기 이전에 소림 무술에 관해 쓰인 역사 문헌인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阐宗)』과 『권경(拳經)』 따위에는 보리달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한다. 아마도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하여오던 다양한 무술 가운데 몇몇이, 소림사에서 전승되던 승려들의 무술을 자기 무굴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정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달마대사가 자기 무술의 원조인 양 꾸몄던 것 같다.4 그렇다고 해서 중국 무술이 20세기 초에 급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국 주(周)나라 시대[BC1111~256]에도 오늘날의 쿵푸와 유사한 운동[무술]이 있었다고 한다.5 호흡법과 기(氣) 수련을 통해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양생(養生)을 이루고 신선을 도달하려는 노력인 도교(道敎)의 내단(內丹)에서도 쿵푸와 유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비록 20세기 서구 연재소설에 등장한 가공의 무술이었지만, 쿵푸는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중국 무술의 연원과 연결되어있는 것이었다.

이 쿵푸는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기 시작하여, 관련 영화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홍콩에서 시작된 이런 추세는 헐리웃에까지 확산되었고,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도 많은 관련 작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쿵푸 소재 영화들 속에서 쿵푸의 의미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지는, 이소룡(李小龍)[Bruce Lee 1940~1973]의 출연작들이나 서극(徐克)[Tsui Hark 1950~]의 작품 《황비홍(黃飛鴻)(Once Upon A Time In China)》(1991)에서 비롯된 시리즈 등 쿵푸 소재 영화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쿵푸 소재 영화의 아류에 속하는 영화를 통하여 쿵푸의 의미와 위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 한 예가 1980년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작으로 만들어진 《신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The Gods Must Be Crazy)》라는 제목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시맨》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다. 부시맨 배우 니카우(1943~2003)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시리즈가 뒤를 이었는데, 1990년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 《비주화상(非洲和尙)6(Crazy Safari, The Gods Must Be Crazy III)》도 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서는 ‘부시맨3-강시와 부시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이 영화에서는 중국 도사가 위기에 처한 부시맨에게 이소룡의 영혼을 강림하게 하여 부시맨이 절권도로 악당부족을 때려잡게 한다. 《신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가 보여준 가장 큰 미덕은 주연 배우들의 슬랩스틱 개그로 꼽혔지만, 부시맨의 눈을 통해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이 영화의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화예술이 얼마나 쉽게 인종주의적 표현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준다는 면도 미덕이라면 미덕일 수 있겠다. 이들에 더하여, 《비주화상》에 이르러서, 영화는 쿵푸의 스승 이소룡을 명확히 권선징악의 상징으로 그려냈다. 이런 면은 영화의 미덕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쿵푸의 성격 하나를 명확히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21세기 들어서서,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쿵푸 소재 영화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주성치(周星馳)[Stephen Chow 1962~]의 작품 《소림축구[少林足球/Shaolin Soccer]》(2001)와 《쿵푸허슬[功夫/Kung Fu Hustle]》(2004) 등이 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잉여적인 등장인물이 각성하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발휘한다고 하는 주성치 작품들의 이야기 구조는 자기계발 이야기를 겉에 두른 권선징악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한다.
수기(修己) 혹은 위기(爲己)의 여러 모습

공부(工夫)라는 말에 담긴 의미의 연원은 『논어(論語)》에서볼 수 있다. 『논어(論語)》〈헌문(憲問)〉에 “나를 수양하여[수기(修己)] 타인을 평안하게 한다”는 말과 “나를 수양하여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한다”8는 말이 있다. “예전 학자들은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위기지학(爲己之學] 지금은 남을 위해 배운다[위인지학(爲人之學)]”9라는 말도 있다. 이 맥락 속에서 ‘남을 위해 배움[위인지학(爲人之學)]’은 사회에 기여함이나 국가에 충성함이 아니다. 타인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며, 명성 혹은 지위를 얻기 위한 공부다. 이는 공부의 한쪽 극단이 아니라 거짓 공부인 것이다. 유학에서는 위기지학만을 진정한 공부로 인정한다. ‘나를 수양함’ 혹은 ‘나를 갈고 닦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수기(修己)가 곧 위기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기와 짝지어져 있는 ‘타인을 평안하게 함[안인(安人)]’ 혹은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함[안백성(安百姓)]’은 수기의 목표 혹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유학자들은 받아들였다. 이 맥락 속에 등장하는 닦음[수(修)] 혹은 닦고 기름[수양(修養)]을, 공부(工夫)라는 이름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정리하여, 두고두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수기치인의 틀을 만들려고 한 것. 이것이 주희가 공부(工夫)라는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한 일일 것이다.
쿵푸/쿵후(功夫)라는 말은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Illustrated Fiction Magazine』이라는 지면에 연재된 소설 『노자 여행기(The Travels of Lao Ts’an)』에 처음 나온 것임을 보았다. 이처럼, ‘쿵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무술을 지칭하는 쿵푸/쿵후(功夫)라는 명칭은, 20세기 초에 영어로 된 소설 속에서 처음 쓰였으나, 그 무술은 분명히 중국 전통 무술의 요소들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그 무술들이 20세기 중반과 21세기에 다양한 쿵푸 소재 영화 속에서 재현될 때, 그들 영화 속에서 무술을 행하는 주인공들은 대개 권선징악의 상징으로 그려지곤 하였다. 이런 영화 속에는 주인공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강자에게 패배하는 장면[좌절]도 반드시 나오고, 패인을 분석[성찰]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피나는 단련을 하는 장면[택선고집(擇善固執]도 나온다. 이는 곧 수양(修養) 혹은 공부(工夫) 이야기였다.
공부(工夫)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몸’이 영화 속 쿵푸/쿵후(功夫)에서는 강조되었던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공자와 주희의 사상은 몸과 마음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희가 공부(工夫)를 논할 때 ‘몸’을 따로 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희가 몸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면 쿵푸 소재 영화들은 작가들이 서구 근대의 심신이원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작가들은 쿵푸/쿵후(功夫)에서 ‘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스펙터클에만 집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작가들이 의도한 바에 더하여, 쿵푸 소재 영화들은 몸에 대한 마음 혹은 정신 우위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객에게 몸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제 공부(工夫)와 쿵푸/쿵후(功夫)는 그것들이 처음 생겨날 때와는 다른 조건 속에서 변화를겪고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learning과 study들 사이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번역되기 껄끄러운 공부(工夫)와 쿵푸/쿵후(功夫)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권선징악이 영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공부(工夫)와 쿵푸/쿵후(功夫)는 누군가가 주어진 대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니, 누군가는 『논어』와 주희의 저작들 그리고 이소룡과 서극 그리고 주성치와 같은 쿵푸 소재 영화 작가들의 작품을 세심하게 챙겨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