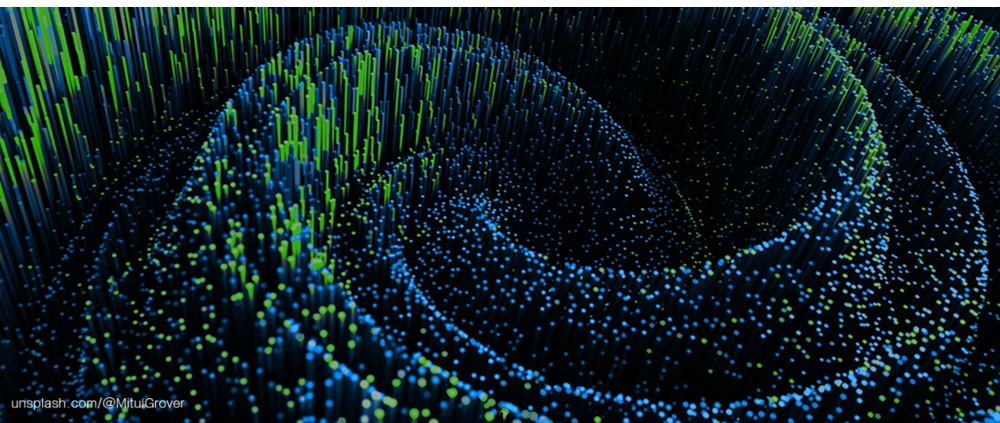‘지역의 발명’ 워크숍이나 강의 때 지역 활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민 관계를 강조하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관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하고 몇 마디 말이나 정의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패턴과 같이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가 한 번에 일직선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살아 움직이는 상호침투의 나선형 순환구조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역동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좌절, 권태, 동요, 긴장, 희열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관계의 특성상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은 힘들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의 저자 어니스트 프리드리히 슈머허(Ernst Friedrich Schumacher)의 정신으로 설립된 슈마허 칼리지의 묘미처럼, 숨겨진 커리큘럼처럼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관계를 준비할 수는 있다. 결과 지향적인 공식적인 교육, 회의, 업무 등과 다른 비공식적인 감춰진 활동으로 서로를 감각하면서 비로써 관계에 필요한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없는 대화를 나누는 제3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제3의 시간과 공간은 결과를 위한 활동과는 다르게 보는 이에 따라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에 경청하고 성찰하며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럴 때 서로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데이비드 봄(David Bohm)은 『대화란 무엇인가 On Dialogue』(1990)에서 “편견이나 상대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 없이 타인의 말에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쌍방의 주된 관심은 진실과 일관성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의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대화의 태도를 강조했다. 관계 생성을 위해서 익숙해져야 할 태도는 인식되는 게 아니라 공동경험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익숙해진 태도와 외부의 환경이 만나 씨줄과 날줄 엮이듯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온 사례들이 있다.
강화도 진강산 공동체처럼 매일, 매주 또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일상을 나누는 생명·평화 단체들이 있다. 요사이 달라진 아이의 생활이나 밤사이 속상했던 일, 부모님 모시는 일 등 소소한 일상을 돌아가며 나누는 시간이다. 바쁜 회의 시간에 한가한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의 나눔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협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는 네트워크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일상의 나눔과 같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감춰진 시간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1/n과 다른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준다. 또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알게 된다면 업무와 협업 스타일도 효과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아와지섬 여자부에서 작은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도쿠시케 마사에씨는 지역 활동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뒤풀이를 강조한다. 일의 앞과 뒤에 준비한 식사와 술자리는 앞으로의 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흔히들 중요한 이야기는 뒤풀이에서 나온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사진 출처: Mika Wegelius
스타벅스의 콘셉트이기도 한 집과 회사가 아닌 ’제3의 공간‘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도시 공간과 아마존, 구글 등 사옥 디자인에도 적용돼 관계를 위해 사람들의 부딪힘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게 한다. 부딪힘은 무의식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발 된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호르헤 구즈만(Jorge Guzman) 교수 연구팀은 「제3의 장소와 기업가정신 : 스타벅스로부터의 증거」에서 7년 동안 스타벅스를 입점한 지역과 안 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매년 적게는 2.9건에서 많게는 5.7건으로 신규 창업 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걸 밝혀냈다.
마을에서 열리는 공동체 영화 상영, 운동회, 플리마켓 등 다양한 예술·문화 이벤트는 이해관계와 차이에서 벗어나 즐겁게 어울리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는 국내외 지역을 살펴보다 보면 예술과 문화가 드러나지 않게 지역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Cialdini) 박사의 『설득의 심리학 Influence』(1984)에 나오는 호혜의 법칙도 관계 형성에서 빠트릴 수 없다. 먼저 베풀면 상대방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법칙이 호의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일본 커뮤니티 디자인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사는 손쉬운 첫 번째 호혜의 신호다. 이밖에도 웨인 베이커(Wayne Baker)의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All You Have to Do Is Ask』(2020)에서 소개되듯, 부탁도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탁하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의 사이에서도 호혜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목적과 목표가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맛있는 밥과 술을 나누자고. 주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책방, 도서관, 시장, 카페 등을 배치하고 절기마다 함께 즐길 예술, 문화 이벤트를 열어가자고. 관계는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은 말해줄 수 있다.
촘촘하게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은 어떤 비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깊은 뿌리를 가진 것과 같다. 그래서 지역사업의 목표는 관계다.
나 또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살롱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