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 ‘모두가 보다 근본적인 질서에 따름’
대동(大同)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다양한 의미로 쓰여왔다. 중국 문헌들 속에서 그 말이 쓰여진 예1를 찾을 수 있다. 시대 순으로 먼저 『서경』 「홍범」의 대동이 있다. “너는 큰 의심이 있거든 꾀함을 너의 마음에 미치고 경사에 미치고 서인에 미치고 복서에 미쳐라. 네가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고 경사가 따르고 서인이 따르면 이것을 대동(大同)이라 하니, 몸이 강강하고 자손이 길함을 만날 것이다.”2 ‘홍범’은 큰 법이라는 뜻으로, 중국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남겼다는 정치 이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유가 경전이기도 한 중국 고전 『서경』에 실려 있다. 하나라는 실재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하였으나, 역대 중국 사서들에서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조로 꼽혀왔다. 『서경』은 중국의 요순시대·하나라·상나라·주나라의 왕들이 내린 포고문·연설문과 신하들의 상소문 등 각종 기록을 모아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들 가운데에는 전국시대[기원전 476년~기원전 22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대동을 포함하여 『서경』에 보이는 사상과 개념들은 전국시대에 형성된 것들로 추정할만하다. 위의 인용문은 화자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점을 치고 정치체의 구성원 모두 점괘에 드러난 근본적 질서를 따름[종(從)]이 대동이며, 그러한 처세는 청자와 그가 속한 족단(族團)[가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로, 청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동은 ‘모두가 보다 근본적이 질서에 따름[종(從)]’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겉보기로는 의견과 행동의 통일 달리 말하자면 일치 혹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산화된 조선시대 문서들을 검색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왕과 관료들이 정책을 논의할 때 각자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3 이때 대동을 언급하는 화자는 자신이 보다 근본적인 질서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며 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질서를 함께 따르자고 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대동이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동은 ‘공동체가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
『예기』 「예운」에서도 대동을 볼 수 있다.
“옛날에 공자께서 납제의 빈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나가서 [성문]관의 위에서 쉬고 있다가, 아! 하고 탄식을 하였다. 중니의 탄식은 대개 노나라를 탄식함이다. 언언이 곁에 있다가 말하였다, “군자께서는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도의 행함은, 삼대의 영웅들이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 끝을 잡았는데 그 곳에 [영웅들의] 뜻이 있다. 큰 도를 행함은, 천하를 공평하게 하고 어질고 잘함을 뽑아서, 믿음을 강구(講究)하고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자기]의 어버이만을 홀로 어버이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홀로 자식으로 하지 않았다. 효도와 자애의 도를 넓혔다. 노인은 [생을 편안히] 마칠 바 있도록 하고, 장정은 쓰일 곳이 있고,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으며,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된 늙은이, 고질병에 걸린 이들을 모두 부양 받을 수 있게 한다. 남자는 직분[사·농·공·상]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이] 있었다. 재화를 땅에 버림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 감추지 않으며, 힘이 자신에서 나오지 않음을 미워하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기를 위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모략은 닫혀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어지러운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지 않는데, 바람의 기운이 [문을]지킬 뿐이었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大同)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셨다.”4
『예기』는 하나라·은나라·주나라 등 이른바 삼대(三代)의 문물· 예법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무렵 전한의 학자 대성(戴聖)이 집대성했다고 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사상에는 전한 시기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동은 ‘공동체가 공공적(公共的)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천하위공(天下爲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공(公)과 사(私)의 구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동은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천하위공(天下爲公)에 보이는 공(公)이라는 가치기준을 제외하고는, 이상사회 실현의 구체적 책략을 『예기』 「예운」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중국 역사에서 공동체에 공공적 가치가 절실히 요청될 때, 대동을 기치로 하는 정치적 운동이 일어나곤 하였고, 그때마다 구체적 책략은 당대의 시대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역사 특히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대동의 의미 변화와 그에 따른 쓰임새들을 조선시대 사회의식의 한 흐름을 살피는 일의 실마리 삼을 수 있다.5
대동은 ‘대공지심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인격이 중심이 된 정치체’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천역전』에서도 대동을 볼 수 있다. 『주역』 「동인」 ‘괘사’는 다음과 같다; “사람과 함께 하되 들에서 하면 형통하리니, 대천을 건넘이 이로우며 군자의 정으로 함이 이롭다”6 『주역』 「동인」 ‘괘사’에 대한 『이천역전』은 다음과 같다.
“남과 함께 하는 자가 천하 대동(大同)의 도리로써 하면 성현의 크게 공정한 마음이요, …… 이미 사사로운 바에 매이지 않으면 지공대동(至公大同)한 도여서 먼 곳도 함께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형통함을 알 수 있다.”7
『이천역전』은 정이[程頤 1033~1107]가 저술한 『주역』 주석서다. 이 책에서 정이는 『주역』의 문구들을 실마리 삼아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수양과 실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예기』 「예운」의 대동이 사(私)에 대비되는 공(公)이라는 가치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천하위공(天下爲公)을 가능하게 하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천역전』의 대동은 사(私)를 억제하고 공(公)을 마음 속에 보존함으로써 대공지심(大公之心)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인격이 중심이 된 정치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범인격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생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으며, 선생과 왕은 모두 최고의 수양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과 왕에게 모두 따라 배울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왕의 스승 역할을 하는 사대부가 왕 못지않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성리학을 국교로 하는 조선이 그런 사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한 실례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임금에게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8 아마도, 사대부들은 이 말을 왕 앞에서 쓰면서, 자신이 대동사회의 주인이라는 강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스승’이 지배하는 사회는 곧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행정하는 사회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조선 지배집단의 도덕적 우월성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조선의 취약성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대동은 ‘평등함을 이루기 위한 저항의 바탕이자 목적’
중국 고전 속의 대동은 ‘모두가 보다 근본적인 질서에 따름’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공동체가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다가,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대공지심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인격이 중심이 된 정치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말은 주로 왕과 왕의 신하 등 지배집단 내부의 사람들이 중시하였던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였고, 때때로 그들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할 때 동원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변하였고, 점차 피지배집단 사람들도 이 말에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정여립[鄭汝立1546~1589]은 ‘천하가 공공의 물건인데, 어디 일정한 주인이 있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한 모임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동계(大同契)라고 하였다. 이때 대동이라는 말 속에서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후 정여립은 대동사상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정여립이 대동이라는 말을 사용한 방식과 유사한 예가 동학농민전쟁, 항일투쟁, 독립운동 등에서도 보인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부각된 내용으로 재정의된 대동 개념은 1608년에 조선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된 대동법이라는 제도 이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논문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의 결론에서, 안병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물납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제도를 대동법으로 명명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다. 애초 이 제도는 공납의 폐단으로 고통을 받던 인민들이 자체적으로 각기 고을을 중심으로 공물 부과를 호(戶)에서 토지로 이관하는 방안을 채택해 왔던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기존의 차별적인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결점을 모색한 것이다. 이 방안으로 가난한 서민들은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대신 토지 소유자들이 공물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인민들은 이를 대동으로 인식하고 제도의 명칭 또한 대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9
안병욱은 대동이라는 말을 수취‘관행’의 이름으로 먼저 사용한 쪽은 인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배집단이 수취‘제도’를 개정하고 새 제도의 이름을 만들 때, 대동이라는 이름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책 당국자들도 처음에는 선혜로 부르다가 인민들의 관행을 좇아 마찬가지로 대동법으로 바꾸어 불렀다. 조선의 지배층들이 대동사상을 이해하거나 수용했던 의도는 이상사회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체제 비판이나 부정이 아닌 정책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대동의 이념을 동원하였다. 오히려 이는 장기적인 체제안정의 방편이었다. 영조나 정조 등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종종 대동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18세기의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붕당의 폐를 줄이려는 탕평정책과, 또 양역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균역법의 시행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대동의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곤 했다.”10
새 제도의 이름에 선혜(善惠)를 넣으려다가 인민들의 관행을 좇아 대동(大同)을 넣긴 하였으나, 정책 당국자들은 개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안병욱은 주장하였다. 선혜는 문자 그대로 착한[善] 베품[惠]이다. 이는 조선 후기 특권적 지배집단의 개량주의적 사고를 상징한다.
안병욱은 지배집단과 인민이 대동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한 일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17세기와 18세기에 있어서 대동론은 대동법이나 호포법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배층을 통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정리할 수 있으며, 19세기는 일반 인민들이 대동론을 내세워 사회개혁을 직접 추진해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민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다 좌절한 호포법을 자체적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혹은 동포제의 형태로 실시해 나갔다. 더 나아가 중세적인 조용조의 수취체제를 아예 토지로 일원화하는 획기적인 세제를 도결제의 형태로 창안해 시행해 나가기도 했다.”11
19세기에 들어서서 인민은 대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취관행을 지역 단위에서 제도하하는 데 까지 나아갔다고, 안병욱은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맞다면, 19세기 조선에서 평등 가치를 담은 대동은 저항을 상징하는 데에서 진일보하여 사회 속에서 구체화되는 데로 이미 나아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안병욱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인민들이 대동론으로 의식화된 조건에서 가능했다. 대동이란 용어는 누가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랐다. 현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논거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고 혹은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인용하기도 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식이 첨예화되었으며 인민들은 그 의식을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이 경우 대동론은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이념의 구실을 했다. 이를 통해 호포제를 시행했고 탈중세적인 도결제를 관철해 나갔다. 이렇게 대동론은 조선후기 사회변화를 투영하고 있는 역사의식이었다.”12
19세기 조선에서 평등 가치를 담지(擔持)한 대동은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도화되기까지 하였다고 안병욱은 주장한 것이다.
대동이 현실화 제도화되는 추세는 일제 강점·분단·한국전쟁·군부독재를 80여년에 걸쳐서 겪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서해안 대동굿(西海岸 大同굿)’·‘용인 할미성 대동굿 (龍仁 할미城 大同굿)’·‘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배연신굿 및 大同굿)’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전역에서 대동이라는 말은, 위에 말한 80여년의 시간을 지나며 다양한 조건을 겪으면서도 지역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면면히 역사를 이어 온 각 지역의 공동체들이 해체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대동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하였다가, 1984년 ‘대동제(大同祭)’가 대학 축제의 이름에 쓰이면서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대동은 ‘차이를 인정한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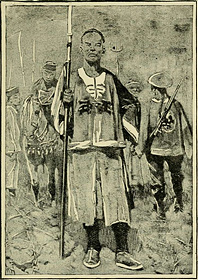
School of Theology, Boston University
2009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허용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동제라는 명칭은 84년 5월 고려대의 ‘석탑대동제’에서 출발한다. 허 교수 등에 따르면 석탑대동제는 강제징집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굿과 길놀이, 마당극, 줄다리기와 같은 대동놀이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판을 선보였고 대동제를 알리는 대형 걸개그림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그해 고려대와 합동위령굿을 지낸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를 필두로 해서 그 모델이 퍼져나갔고 87년 5월쯤엔 전국 대학축제 대부분이 대동제를 표방하게 됐다.”13 1985년의 대동제는 “쌍쌍파티와 체육대회, 학술제 중심의 대학축제를 풍물패 중심의 마을굿이나 줄다리기와 같은 농민 공동체 놀이 위주의 행사로 전환”14하는 사건이었다고 묘사된다. 『세계일보』에 요약된 바에 따르면 허용호는 대동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허 교수는 대학가의 대동제 바람이 탈춤과 마당굿 등 60∼70년대 문화운동권이 축적한 민속·전통 지향의 역량, 쌍쌍파티·메이퀸선발대회와 같은 70년대 말 ‘퇴폐적·향락적·제국주의적 대학문화’ 거부·파괴 움직임 그리고 축제를 통해 ‘생산자[총학생회/문화동아리]와 향유자[일반 학생]가 하나가 되는 문화’ ‘투쟁과 놀이의 공동체’를 만들려 했던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성향과 83년 당국의 대학자율화 조치 등이 빚어낸 결과로 봤다. 민중과 접촉면을 넓히려는 대학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대학 자율화’라는 외부 요인과 결합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운동권에서의 생활문화론 논의와 자율화 조치, 대학 내에서의 공동체 놀이문화의 확산과 기존의 관성적 축제의 거부의식 확산 등이 모체가 돼 대학 대동제가 탄생한 것”이라며 흔치 않은 기회를 활용한 학생운동의 능동적인 역할을 평가했다.”15
대동제가 시작된 1985년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24년 연세대학교의 학내언론 『연세춘추』는 연세대학교의 대동제를 소개하였는데, 거기에 보이는 대동제는 앞서 허용호가 소개한 대동제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다.16 같은 2024년 고려대학교의 학내언론 『고대신문』은 역대 대동제를 돌아보며, “대동제는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장일까?”, “즐거움과 취미를 위한 축제일까?” 라는 문제를 던지는 기사를 내보냈다.17 등장 40년을 지나면서 대동제는 큰 변모를 겪고 있는 듯하다. 19세기 말까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점증되다가, 일제 강점·분단·한국전쟁·군부독재를 80여년에 걸쳐서 겪으면서 큰 변화를 겪은 대동의 위상은, 1985년 대동제라 대학 축제의 이름이 되면서 잠시 고양되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서서히 축소지향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듯하다.
2018년 『숭대시보』 수습기자 김지은은 대동제라고 할 때 대동의 뜻을 ‘다 함께 크게 어울려 화합한다’ 혹은 ‘크게 하나가 됨’이라고 풀이하였다.18 이러한 대동 풀이는 중국 고전 속의 대동과도 다르고, 조선시대 왕과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대동의 풀이와도 다르며, 정여립의 대동계나 대동법에서의 대동의 풀이와도 부합되는 바가 확연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대동 풀이는 대동계의 바탕에 깔려있었을 만한 정서나 대동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당히 어울려 보인다. 이 대동 풀이에는 차별·불평등·불공정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합되는 정서와 친화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을 보면 대동제의 대동은 대동계의 대동이나 대동법의 대동과 연결되어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에서 대동제는 축제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형세이지만, 대동이라는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21일에서 22일에 걸쳐, 길고 추운 겨울 밤 동안 진행된 동지(冬至)의 결사(結社)와 연대(連帶)는 외형 상 대동제를 떠올린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에는 대동제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는 듯하다.
우선 그것은, 비가시적이지만 질기고 광범위한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 낸, 농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뒷받침하는 결사였다. 이런 결사에 힘입어 양곡관리법 거부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12월3일 쿠데타에 분노한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우금치에서 멈춘 지 130년 만에 비로소 서울로 들어서고, 이태원의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 결사는 농민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행하여져 온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에 맞서기 위하여 대단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면서도 서로 이질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루어낸 것이었다. 결사는 경찰의 농민 멸시를 인민 전체에 대한 멸시임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이없음을 결사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들은 모멸감이나 분노를 느꼈다기보다는 어이없다는 느낌을 공유했기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결사를 이룰 수 있었던 듯하다. 이는 그만큼 인민의 마음과 희망의 힘이 강해졌음을 암시하는 것일 듯하다.
또한 그것은, ‘따로 또 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정체성에 큰 차이가 있으면서도, 차이에 연연하지 않고, 당면 문제가 공통의 것임에 주목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연대였다고 할 수 있다. 동지 연대 참여자들 중에는 12월 3일 국회 지키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면서, 동지의 밤 남태령으로 달려오는 것을, 12월 3일 국회를 둘러쌌던 사람들에 대한 심정적 연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는 듯하였다.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 중에는 1980년 서울의봄과 광주 학살에 대한 직간접의 기억과 상처를 안고 있음직한 연령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동지 연대 참여자들의 주류는 2030여성과 소수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면을 보면 동지 연대는 ‘차이를 인정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25년의 남한 사회로부터 나올 수 있는, 대동 개념에 대한 재정의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이 2024년 12월 23일 발표한 성명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다시 한 번 대동을 ‘차이를 인정한 연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주었다.
“역사는 지난 이틀을 ‘남태령 대첩’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저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 속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도시 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별도 세대도 지향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연대를 넘은 ‘대동의 남태령’을 열어냈기 때문입니다.”19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187~217쪽 참조. ↩
『書經』 「洪範」 “汝則有大疑, 謀及乃心, 謀及卿士, 謀及庶人, 謀及卜筮. 汝則從, 龜從, 筮從, 卿士從, 庶民從, 是之謂大同, 身其康彊, 子孫, 其逢吉.”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187~217쪽 참조. ↩
『禮記』 「禮運」 “昔者仲尼與於蜡賓, 事畢, 出遊於觀之上. 喟然而嘆. 仲尼之嘆蓋嘆魯也. 言偃在側, 曰, “君子何嘆?” 孔子曰,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 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弃於地也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187~217쪽 참조. ↩
『周易』 「同人」 ‘卦辭’ “同人于野, 亨, 利涉大川, 利君子, 貞.” ↩
『周易』 「同人」 ‘卦辭’ 『伊川易傳』 “夫同人者以天下大同之道, 則聖賢大公之心也, …… 旣不繫所私 乃至公大同之道, 无遠不同也, 其亨 可知.”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187~217쪽 참조.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214~216쪽.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214~216쪽.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214~216쪽.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大同論)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214~216쪽. ↩
「신촌·국제캠 대동제,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 h:OURS; 개교 139주년 무악대동제 ‘h:OURS’ 미리보기」, 『연세춘추』, 2024-05-27. ↩
김동현·조인우 기자, 「시대 따라 변화한 대동제, 축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고대신문』, 2024-06-03. ↩
김지은 수습기자, 「왜 대학 축제를 ‘대동제’라고 부를까?」, 『숭대시보』 1213호, 2018-09-10. ↩
이오성, 「서로를 가르친 28시간, 남태령은 ‘학교’였다」, 『시사인』, 2025-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