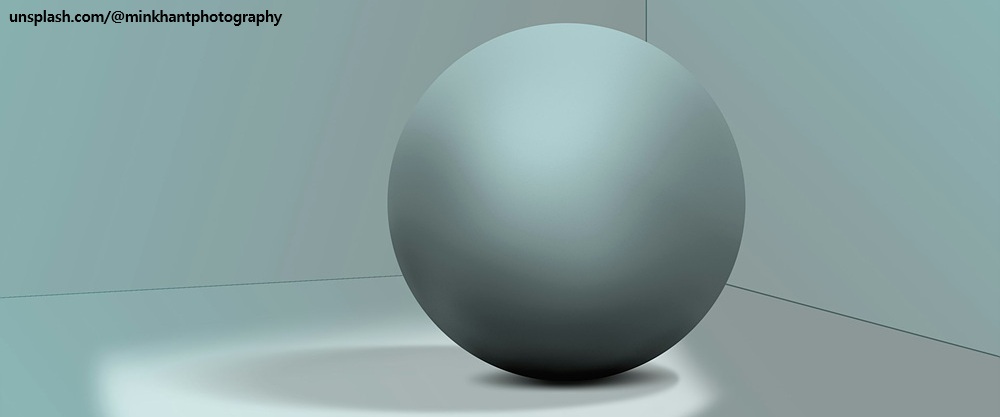과학 대신 격물치지학
오늘날의 영어 단어 ‘science’는 한국어로 과학(科學)이라고 번역한다. 처음 이런 번역어를 만든 사람은 아마도 모든 기존의 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서의 철학(哲學) 혹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과 그가 놓인 세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체계로서의 신학(神學)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대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활동 즉 분과학문(分科學問)이 ‘science’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때의 분과학문의 줄임말이 과학이다.

이 ‘science’가 한때 격물치지학(格物致知學)이라고 번역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개화기에 그랬다고 한다. 개화기로 접어든 조선에서는 아직도 성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그런 성리학에서 격물치지는 도덕적 삶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4서3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는 도덕적 삶을 8단계로 설명하는 8조목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여기에서, 다른 단계 다른 조목들은 한자를 몰라도 누구나 그 뜻을 대략 감잡을 수 있을 듯한데, 격물과 치지 특히 격물이 무슨 뜻인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날 『대학』을 번역할 때 대개,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함”1, 치지는 “지식이 극진한 데 이름”2이라고 번역한다. 개화기에 ‘science’를 격물치지학(格物致知學)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함” 정도로 이해하였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science’를 격물치지학이라고 번역하려 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원래는 성리학의 수양론의 한 단계를 지칭하였던 이 번역어가 ‘science’와 1:1로 대응될 수는 없는 것이었음에도, 번역자가 굳이 이 말을 번역어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나름의 깊은 고민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넓게는 자연과학 좁게는 물리학(物理學)의 의미로 사용된 격물치지학은 서구 근대의 자연과학 및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서양 문명이 도래한 이후, 격물치지는 유학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나 지식 체계와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가능성과 과제를 지닌 개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격물치지’ [집필: 엄연석])3
이 주장은, 번역자가 유학과 ‘과학적 탐구 방법’ 사이의 연결이 아직은 그저 과제로 남아있음을 불안해하며, 연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격물치지학이라는 이름의 사용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직 성리학 일색이었던 조선에서, 주자학도들이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에 거부감을 덜 가지기를 바라서, 격물치지학이라는 번역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物)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상상도 가능하다. 개화기의 번역자가, 조선의 사상적 전통 속에 ‘science’를 그저 지엽말단적이며 수단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직결시키는 도덕적 문화적 힘이 갖추어져있음을, 조선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다는 상상도 가능한 듯하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은, ‘과학조차도’ 도덕과 직결시키는 문명국가로서, 비정한 문명의 이기를 앞세우고 무도한 침탈을 감행하는 서구 국가들보다 드높은 문명을 갖춘 나라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science’가 가치중립적이라는 판단을 중요한 전제들 가운데 하나로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science’가 가치중립적이라는 판단은 그 유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개화기에 이미 서구의 학자들은 ‘science’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구 제국들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science’가 가치중립적인 양 꾸미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착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상을 좀 더 밀고 나가다 보면, 격물치지와 관련된 물(物)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물은 ‘matter’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다음 단계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물은 ‘matter’와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선 앞서 논한 격물치지에서의 물을 두고도, 성리학도들은, 격(格)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을 통하여, 물을 대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물을 어떤 것이라고 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세기의 저명한 중국 고전 연구가 정현(鄭玄)4은 “격은 오는 것이다[格來也]”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마치 물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적어 놓은 것 같다. 이는 물이 움직이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정현은 물 가운데 사람의 삶에 문제가 되는 물이 생긴 상황을 의미있는 사건[event]으로 직시하는 것을 도덕과 도덕적인 정치[평천하]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보는 사고방식의 실마리를 마련한 듯하다. 11세기가 되었을 때 장재(張載)5는 “격은 제거하는 것이다[格去也, 物外物也]”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격물은 물 특히 평천하를 이룩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물을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면서, 사대부가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일을 처리하려면 욕망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므로 욕망을 일으켜 사대부의 길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기인한 격물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하면, “격은 헤아리는 것이다[格度也, 猶曰品式也]”라고 하였다는 호안국(胡安國)6은, 장재와 활동 시기가 30여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그 30여년 사이에 유학자들이 물을 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삶으로부터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서 의 물이 조응하면서 욕망 발생의 원인을 헤아림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적 삶의 추구가 평천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물(物)과 아(我) 그리고 세계
격물-치지-성의-정심이, 수양군자인 사대부의 수신-제가에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사대부에 의하여 유교적 교양을 갖추게 된 군주의 치국-평천하로 연결될 것으로 상정하는 8단계의 공부론 겸 이상정치론의 첫 단계인 격물에 관한 설명의 변화와 다양화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한 개념의 이해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회역사적 변화 속에서 만인이 공유하는 경전 속의 개념 하나에 변화를 반영시켜, 그 개념이 세계의 진보 속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였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역사는 12세기 남송에서 한 번 집대성된다. 주희(朱熹)7가 그런 집대성을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대학』 원문에서는 격물치지를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설명하였다.
“나의 지식을 완성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데 있다[致知在格物]”,
“사물의 이치가 궁극에 이른 다음에 지식이 극진한 데 이른다[物格而後知至]”
“이것을 나의 지식이 극진한 데 이르렀다고 말한다[此謂知之至也]”
주희는 이 세 문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인 ‘此謂知之至也’ 앞에 내용상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대학』 주석서를 편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格物致知補亡章(격물치지보망장)’이라는 이름의 짧은 설명을 보충하여 넣었다. 그 설명 전체는 다음과 같다.
근간에 일찍이 몰래 정자의 뜻을 취하여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충하였다. “이른바 ‘앎을 극진히 한다는 것은 사물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앎을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따지는 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앎이 있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오직 이치에 대해 따지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앎이 극진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태학(太學)에서 처음 가르칠 적엔 반드시 학자에게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아는 이치에 따라 더욱 그것을 따지게 하여 그 극치에 이르기를 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지력(知力)을 쓴 지 오래되어 하루아침에 환하게 이치를 관통하게 됨에 이르면 뭇 사물의 겉과 속, 정밀함과 거침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온전한 체(體)와 거대한 용(用)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사물이 이르러 온다’고 말하고, 이것을 ‘앎의 극치’라 말한다.”8
주희는 “‘앎을 극진히 한다는 것은 사물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致知在格物]’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앎을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欲致吾之知]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따지는[卽物而窮其理] 데 있음을 말한 것”9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치지[앎을 극진히 함]는 “나의 앎[吾之知]을 극진히 함”이고, 격물[사물을 올바로 파악함]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따짐”이다. 여기에서 ‘나의 앎’에 주목하여 보면, 주희가 나[我]와 물[物]을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물은 ‘matter’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인다. 요컨대 중국적 전통에서 물(物)은, ‘matter’와 1:1로 대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我]가 마치 세계 밖에서 세계를 관조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로 설정 내지는 정립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아는 이치에 따라 더욱 그것을 따지게 하여 그 극치에 이르기를 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세계의 어느 한 국면 한 부분과만 연결되어 있는 듯해 보이는 한 사람의 인생의 중대 사건도, 결국은 세계 전체 그리고 그 사람까지도 연동된 상태에서 상호 교감할 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닌 듯하다.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말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일체(一體)라는 부분보다 물아(物我)라는 부분에 주목하여보면, 물과 아가 상호 대비되면서 연동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성리학 보다는 기원전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도가의 사상을 설명하는 데 더 적확한 말 같기도 하지만 주희의 사상과도 썩 어울리는 말 같아 보인다. 주희의 사상에서 그리고 앞서 열거한 여러 성리학도들이나 정현의 사상들에서, 물은 ‘matter’와 1:1로 대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我]가 마치 세계 밖에서 세계를 관조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로 설정 내지는 정립되는 어떤 것인 듯하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17세기에 조선의 윤휴(尹鑴)10가 격물치지의 격(格)을 감통(感通)이라 하고 물(物)을 명덕(明德)·신민(新民)의 일이라고 한 것이 주희의 생각과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닐 듯하다는 생각도 든다. 주희와 윤휴는 자기(自己)를 완성하고 타인(他人)을 완성시켜 모든 타고난 생명을 순조롭게 만드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11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담지한 물은, 논리전개 상의 필요에서, 이에 대한 대비 상으로 가설할 수는 있으나, 아와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한때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과 정신이나 몸과 마음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소박한 이원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렇다 할 반성 없이 마냥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객관성 가치중립성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찌 보면 19세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말한 소박한 이원론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 소박한 이원론은 주희와 성리학도들의 사상을 이해할 때도 거침없이 적용되어왔다. 그래서, 주희의 사상에 호감의 가진 사람들조차도, 대세에서 이탈하였다는 비판이 두려운 대중들처럼, 주희의 사상에서 소박한 이원론에 부합되는 논리적 얼개를 찾아내려고 하였던 듯하다.
지금 아니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물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물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장착(裝着)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폭시켜 왔다. 돌도끼를 사용하였으며, 안경을 사용하였고, 렌즈와 인공관절을 몸에 부착하고 삽입하였다. 힘의 증폭을 위하여 ‘위대한 정신’이 깃들었다고 상정되어있는 몸을 각종 증폭의 허브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급격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외부기억장치의 출현에 설렘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 국면에서 아(我)와 물(物) 사이의 관계를 관조해 보아야 한다면, 그간 소박한 이원론에 의거하여 본 나머지 무심코 지나쳤던 주희의 논리 따위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보려 하는 것이 무익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大學』 “致知在格物[나의 지식을 완성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데 있다]” 참조 ↩
『大學』 “物格而後知至[사물의 이치가 궁극에 이른 다음에 지식이 극진한 데 이른다]” 참조 ↩
박정심, 「개항기 격물치지학(格物致知學)(science)에 관한 연구」(『한국철학논집』 3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 참조 ↩
중국 후한의 학자(127~200). 자는 강성(康成). 마융(馬融)에게 배웠으며, 일경(一經) 전문(專門)의 학풍을 타파하고 훈고(訓詁)에 힘썼다. 『육예론(六藝論)』을 저술하였고, 『시전(詩箋)』, 『예기』, 『주역』, 『논어』, 『효경』 따위를 주해하였다. ↩
중국 북송의 유학자(1020~1077).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橫渠).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조화시켜 우주의 일원적 해석을 설파함으로써 이정ㆍ주자의 학설에 영향을 끼쳤다. 저서에 『역설(易說)』, 『서명(西銘)』, 『동명(東銘)』 따위가 있다. ↩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은 북송 후기 남송 전기의 역사가·유학자이자 관료로, 자는 강후(康候)이며 건녕부 숭안현(崇安縣) 사람이다. 송 철종 소성 4년(1097년) 진사가 되었고, 태학박사 등을 역임하였다. 송 고종 연간에는 중서사인에 임명되고 시강관(侍講官)을 겸임하였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호굉(胡宏, 1105~1161)이 그의 3남이다. 주요 저서에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30권과 『자치통감거요보유(資治通鑑擧要補遺)』 100권 따위가 있다. ↩
주희(朱熹, 1130~1200)는 남송의 유학자다.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산인(雲谷山人)·둔옹(遯翁). 도학(道學)과 이학(理學)을 합친 이른바 송학(宋學)을 집대성하였다. ‘주자’라고 높여 이르며,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한다. 주요 저서에 『시전』, 『사서집주(四書集註)』, 『근사록』, 『자치통감강목』 따위가 있다. ↩
朱熹[撰], 『大學章句』, ‘格物致知補亡章’; “間嘗竊取程子之意, 以補之. 曰: “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敎,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겹따옴표 속이 ‘격물치지보망장’이다. 이 부분은 134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 부분의 6자는 본문에 있던 것이다. ↩
朱熹[撰], 『大學章句』, ‘格物致知補亡章’, “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
윤휴(尹鑴, 1617~168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격물치지’ [집필: 엄연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