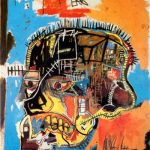루돌프 바로(1935.11.18 ~ 1997.12.5)는 동독의 반체제 인사였다. 사후 그는 철학자, 정치인, 작가로 인식되어왔다. 바로는 서독 녹색당(The Greens)의 지도자였지만 당의 정치조직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당을 떠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적인 접근을 탐구했다.
초기 생애와 교육
바로는 축산업 컨설턴트인 막스 바로(Max Bahro)와 이름가르트 바로(Irmgard Bahro)(결혼 전 성은 콘래드Conrad)의 세 아이 중 첫째였다. 1945년까지 바로 가족은 로어실레시아(Lower Silesia)에 살았다. 처음에는 바트 플린스베르그(Bad Flinsberg)의 온천마을에서 그 다음에는 인근의 게어락스하임(Gerlachsheim)에서 살았다. 바로는 이곳에서 마을 학교에 다녔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막스 바로는 국민돌격대(Volkssturm)에 징집되었고 포로로 잡힌 후 폴란드 재소자로 구금되었다. 동부 전선이 가까워지자 바로 가족은 피난을 갔고, 바로는 도피 중에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다(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이내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바로는 오스트리아와 헤센에서 고모와 살았다. 각 지역에서 여러 달을 지내던 바로는 리젠(Rießen)(현재 지데히옴(Siehdichum)의 일부)에서 한 과부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아버지와 결국 재회했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바로는 퓌르스텐베르크(Fürstenberg)(현재 아이젠휘텐슈타트(Elsenhüttenstadt)의 일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생은 모두 〈자유독일청년단〉(Free German Youth, FDJ)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도 마지못해 1950년에 가입했다. 그가 훗날 언급했듯이 그가 압력 하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해 무언가를 한 건 이때뿐이었다. 1952년 그는 사회주의통일당(Socialist Unity Party, SED)에 입당 신청을 했고, 1954년에 가입했다. 바로는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을 다녔고 철학을 공부했다. 그를 가르쳤던 선생 중에는 (훗날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론가가 된) 쿠르트 하거(Kurt Hager), 게오르크 클라우스(Georg Klaus), 볼프강 하이제(Wolfgang Heise)가 있었다. 그의 논문 주제는 “요하네스 R. 베허 그리고 독일 노동계급과 그 당이 우리 인민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 갖는 관계”였다.
1956년까지 바로는 레닌과 스탈린을 흠모했다. 1956년 2월 흐루쇼프의 누출된 “비밀 연설”이 그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폴란드의 10월과 헝가리 혁명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고, 반란자들과의 연대를 대자보로 표현했으며, 동독(GDR) 리더십의 제한적 정보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한 견해 때문에 국가보안부는 2년 동안 그를 감시했다.
당무
정부 면허 시험을 통과한 뒤 사회주의통일당은 바로를 작센도르프(Sachsendorf)(린덴도르프(Lindendorf)의 일부)로 보냈다. 그는 지역 신문 『전선』(Die Linie)을 편집했고 지역 농부들이 LPG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독려했다. 1959년 바로는 러시아어 교사 군둘라 람케(Gundula Lambke)와 결혼했다. 부부는 딸 두 명(그 중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과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그밖에 군둘라의 딸도 있었다. 1960년 바로는 그라이프스발트대학교의 당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우리들의 대학』(Unsere Universität) 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장을 맡았다. 같은 해 그의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이 방향으로』(In dieser Richtung)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다. 1962년부터 바로는 베를린의 〈유니온사이언스 집행위원회〉(Corporat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ion Science)(〈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Free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의 한 분과)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1965년 그는 〈자유독일청년단〉의 학생 잡지, 『포럼』(Forum)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바로는 〈자유독일청년단〉에서 재임하는 동안 사회주의통일당의 점점 구속하는 정책과 갈등을 빚은 탓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고, 바로는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1967년 바로는 폴커 브라운의 글을 허가 없이 출간했다는 이유로 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사상의 진화
1967년부터 1977년까지 바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에서 조직 개발 전문가로 일했다. 그는 공장의 상황을 경험한 뒤 동독 경제는 위기 상태이며 그 주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내 내렸다. 그는 1967년 12월 주의회 의장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관점을 표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작업장의 직책을 노동자들에게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몇 주 뒤 프라하의 봄이 시작되었다. 바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운동을 지지했다. 1968년 5월 그는 중앙위원회 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위원은 “대항-혁명”과 바로의 연대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바로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출판하게 되었다. 그의 결심은 8월 21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더 굳어졌다. 바로가 훗날 말했듯이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으며 그가 사회주의통일당과 최종적으로 갈라서게 된 이유였다. 바로는 자신의 책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 결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출처 : wikipedia
1972년 바로는 VEBs(동독의 국영 기업)에서 고등학교와 기술대학(technical-college) 집단의 발달 조건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주제별로 더 광범한 원고를 비밀리에 썼고 이것은 이후 『대안』(The Alternative)에 수록되었다. 1973년 군둘라는 이혼을 신청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신청은 정부의 보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고 훗날 말했다. 그러나 1974년 군둘라는 비밀 책 프로젝트를 국가보안부에 알렸고 원고 한 부를 넘겼다. 그 후 바로는 감시 받게 되었다.
1975년 바로는 로이나-메르제부르크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 Leuna-Merseburg)에 논문을 제출했고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조작했다. 『대안』 작업은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책을 동독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1976년 12월 그는 자신의 지하출판물 중 하나가 비밀경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고,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중개인들이 서독 출판사 오히오페이션 버라그산슈탈트(Europäische Verlagsanstalt)와의 계약을 알선했다. 스위스 음악학자 해리 골드슈미트(Harry Goldschmidt)가 최종 원고를 서베를린으로 밀반출했고, 원고 복사본은 우편으로 동독의 개인에게 발송되었다.
훗날 서독에서 바로는 『대안』의 이론적 토대가, 칼 비트포겔이 1957년에 쓴 『동양적 전제주의: 총체적 권력의 비교 연구』와 초기에 쓴 맑스주의 저작들이라고 말했다. 바로는 후자의 반(反)공산주의 때문에 비트포겔을 인용할 수는 없었다. 비트포겔은 바로의 후기 생태주의 작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안』
『대안』은 세 부로 나뉘어 있다.
- 산업 사회로 가는 비자본주의적 경로
- 사회주의 해부
- 공산주의적 대안을 위한 전략
서론은 공산주의 운동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변화만 이룬 채 자본주의적 경로를 계속 따라갔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노동하는 대중들의 소외와 서발턴 정신구조는 새로운 수준에서 계속된다.” 그 책은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1부는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바로는 소련에서(따라서 동독 같은 국가에서도) 이론적으로 예측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원형적 사회주의(proto-socialism)의 형태가 출현했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그는 소련의 10월 혁명의 시기는 맑스의 역사 이론에서 상정된 발전 단계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레닌이 선택한 경로는 옳았다. 바로는 이어서 진행된 스탈린의 대규모 산업화를 필요한 발달로 간주하면서 당 숙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한다.
2부에서 바로는 자신이 보기에 “현실 사회주의”라고 부정확하게 — 사실 여전히 계급 사회인 것을 감안해 볼 때 — 불리고 있는 기존 사회 체계를 분석한다. 그는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뒤, 이것이 경제 침체과 관측된 이유였다고 주장한다.
3부에서 그는 해결책을 개발했다. 그 해결책은 사회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을 변형하는 새로운 혁명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 그 혁명의 의도는 서발턴 정신구조, 즉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 형태와 사고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분업의 폐지를 요구했다. 모두가 과학 노동, 예술 노동, 보잘 것 없는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반응
1977년 8월 22일, 서독 잡지 『슈피겔』(Der Spiegel)은 『대안』에서 발췌한 글과 바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시 그는 책을 쓰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 날 바로는 체포되었고 베를린-호엔쇤하우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날 저녁 서독 TV 방송국 ARD와 ZDF는 바로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9월 초 책이 판매에 들어갔다. 초판은 배송하기 전에 매진되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대안』은 서유럽 좌파 사이에 사회주의의 본성에 관한 논쟁을 촉발했다. 마르쿠제는 바로의 책이 “근래 수십 년 사이에 나온 것 중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트로츠키주의자 어네스트 만델도 유사한 견해를 내비쳤다. 로렌스 크레이더에게 바로는 “혁명의 양심, 진실의 힘”이었다. 루디 두치크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바로가 레닌주의와 거리가 멀고 인권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고 분류하고 그의 제안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분석들과 함께 바로에 대한 공개적인 연대의 물결이 크게 퍼져나갔다. 그 물결은 1978년 2월 1일 『타임스』에 하인리이 뵐과 귄터 그라스가 쓴 편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 편지에는 아서 밀러, 그레이엄 그린, 캐롤 스턴,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등 다른 유명인사들도 서명했다. 그러나 동독에서 바로의 인식은 금지되었고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한 반응과 이후의 체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가 동독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부쳤던 『대안』의 복사본 중 절반 정도는 당국이 가로챘다. 동독 학생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 자체가 동독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서독 정보부를 위해 일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그는 서독 정보부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얻었다고 여겨졌다). 1978년 6월 30일 바로는 비공개 상태에서 반역죄와 국가 기밀 유출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8년형을 받았다. 그 평결이 미리 정해진 엉터리 재판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가 동독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는 즉석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그 평결은 서구에서 즉각 폭력적인 항의와 연대의 표현을 촉발했다. 〈루돌프 바로 석방 위원회〉는 국제 컨퍼런스를 조직했다. 서베를린에서 1978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2000명이 넘게 참석했다. 1979년 5월 11일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에서의 동독 내각에 대한 항의는 그 연대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12개 국가의 〈바로 위원회〉가 그 행사를 조직했고 많은 유명인사들이 서명했다. 바로는 〈국제인권연맹〉(베를린)이 주는 카를 폰 오시에츠키 메달을 수상했고 〈국제 펜클럽〉 스웨덴 및 덴마크 지부의 회원이 되었다.
1979년 10월 11일 동독 수립 30주년에 바로는 사면되었다. 10월 17일 그는 자신이 7월에 요청한 사항에 따라 전처, 두 아이, 파트너 우르술라 베네케(Ursula Beneke)와 함께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로 강제추방되었다.
서독에서의 작업
서독에서 바로는 곧 초기 녹색당에 가입했다. 타협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향과 가치 기반 보수주의 경향을 연합하는데 전념했다. 1980년 책은 새로운 정책의 요소들을 정식화했다. 생태학과 사회주의의 관계가 그것이다. 『대안』에서 내비친 입장에서 벗어난 바로는 이제 고전 맑스주의가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바로의 사고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은 종교였다. 바로는 구류 중일 때 성경을 연구했고, 서독으로 이주했을 때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불행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성찰과 초월성의 결여로 해석했고,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유물론적 관점을 거부했다. 인간 해방의 목적은 칼 맑스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이 맥락에서 바로는 초기 기독교와 해방 신학을 참조했다.
1980년 초 바로는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교에서 오스카 넥트의 지도 하에서 연구했다. 그의 논문은 책 – 『창조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호소』(A Plea for Creative Intiative) – 으로 나왔다. 1983년 그는 사회 철학에서 하빌리타치온을 획득했다.
1982년 바로는 현대 경제 위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경제·환경·사회정책 관점에서 사회의 재구조화를 지지했다. 이것은 세계시장으로부터 광범위한 퇴각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에서의 탈피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는 핵 없는 유럽을 지지하며 평화운동에도 몸담았다.
바로의 〈데어 코뮌〉(Dare Commune)은 녹색당 초기의 대안 공동체였다. 그는 사회의 전환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사람들 자체의 변화와 영성의 재발견을 필요로 한다. 바로는 베네딕트회와 신비주의적인 신(god) 경험의 영향을 받았다.
1981년 바로는 북한을 방문했고 국빈 예우를 받았다. 그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여행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그가 동경하는, “기본적인 안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간 여행이었다. 1983년 여름 미국에서 진행한 강연 투어의 일환으로 바로는 오쇼 라즈니쉬와 라즈니쉬푸람에서 여러 주를 보냈다.
1983년 3월 녹색당이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독일사회민주당(SPD)과 연립 정부를 꾸릴 것인지 야당으로 남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는 후자를 강하게 옹호했고(이로 인해 그는 요수카 피셔와 대립했다) 개혁보다는 리뉴얼을 믿었다. 1984년 12월 “함부르크 연설”에서 바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비교했다. 당시에도 지배적인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변화를 원했던 광범한 운동이 사회에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오류와 정치적 재앙을 막는 것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의 “갈색” 극(나치)은 “변장한 국가주의적 신화”로 좌파를 압도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저항”은 시작될 수 없었다. 바로의 “대중 봉기”는 이번에는 폭력 없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녹색당이 시스템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바로는 또한 좌-우 분할의 극복을 요구했다. 소수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녹색당은 또한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의 영역에 침투”해야 했다. 바로의 함부르크 연설은 요수카 피셔의 지지자들이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끝이 났다. 내전과 이후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985년 여름 바로는 녹색당을 떠나 새 책에 집중했다. 그 책은 1987년 『구원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절멸의 논리”와 그 논리가 현재 인류에 끼친 영향을 기술했다. 그리고 “삶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의식의 도약”과 산업적 “거대기계”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한다. 악화되는 환경 위기가 비상 정부를 낳기 전에 “구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바로는 장기 목표, 단기 전술의 제거, 정부의 탈중심화를 요구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옹호했고, 이는 필수적인 영적 차원을 제공할 것이었다. 좌파의 보수주의자로서 그는 독일기독교민주연합 정치인이자 비평가인 쿠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와의 공통지반에 주목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고무된 바로는 “환경 변화의 군주”를 바랐고 영국 상원과 비슷한 합의 지향 기구 수립을 제안했다. 그 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군주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바로의 언급은 비판 받았다.
1986년 바로는 보름스(Worm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학습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은 그의 사상과 매개가 특징이었다. 그는 1983년부터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던 베아트리체 잉거만(Beatrice Ingermann)을 만났다. 그녀는 아이펠(Eifel)에 공동체도 있었다. 바로는 그녀의 집단에 가입했다. 그들은 1988년 결혼했고 딸을 낳았다.
장벽이 무너진 후 베를린에서
1989년 말 동독의 급속한 쇠락을 지켜보면서 바로는 두려웠던 “동독의 매각”, 즉 연방공화국의 흡수와 싸우기 위해 동베를린으로 갔다. 그는 그 체제가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가 가장 위대한 정치적 성취 –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 로 여겼던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하길 원했다.

사진출처 : 독일 연방 기록 보관소
1989년 12월 16일 바로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임시 전당대회의 연합 대표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그 당의 의장은 일주일전 바로의 변호사였던 기지였다. 의제의 주요 항목은 당을 유지할 것인가 해산할 것인가였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당은 새로운 명칭 – 민주사회당 – 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청 연사로서 그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게 해달라는 바로의 요청은 겨우 과반(54%)을 얻었고 그는 요청했던 45분이 아니라 30분만 승인 받았다. 바로는 이 점에 화가 났고 즉석으로 연설해야 했다. 그는 그의 책 『대안』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낭독한 다음에 이전 연설자인 총리이자 당부의장 한스 모드로(Hans Modrow)뿐 아니라 맑스, 고르바초프, 옐친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동독의 “사회생태적” 재구조화라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동독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급진적인 환경 사상은 대표들이 관심 있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논쟁적인 도입부는 격렬한 분노를 촉발했다. 바로는 자신이 더이상 이 당과 공통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990년 봄 그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사회생태학 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Ecology) 설립을 준비했다. 그는 이 연구소가 생태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아니라 그 쟁점을 전체론적으로 다루기를, 특히 위기의 더욱 심층적인 사회적·문화적 원인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개발하기를 바랐다. 그에 따라 바로는 사회생태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다른 학파들과 혼동되지 않는 고유의 사회과학 학파를 설립했다.
1990년 6월 16일 다시 기지의 변호를 받은 바로는 동독 대법원에 의해 복권되었다. 12월 15일 동독이 사라지기 직전 교육과학부 장관은 바로를 훔볼트 대학교 사회생태학 부교수로 임명했다. 1990/1991 겨울 학기부터 바로는 환경 위기 쟁점을 다루는 과목을 정기적으로 열었고, 자신의 책 『구원의 논리』(이 책은 영어로 Avoiding social and ecological disaster: the politics of world transformation: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spiritual and ecological politics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에서 제시했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가 초빙 연사를 자주 초대했던 그 강의는 모든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대학 외부의 청중도 끌어들였다. 첫해에는 대학교의 가장 큰 강당이 항상 가득 찼고, 이것은 그 강의의 토대가 된 그의 책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연구소는 임시적인 상태로 남았다. 그곳은 슈바이스푸르트 재단(Schweisfurth Foundation)의 재정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될 수 있었다. 1995년이 되어서야 연구소는 농업 및 원예학부의 워킹그룹으로 대학에 통합되었다.
1990년에는 바로가 “생태 독재”를 꾀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이 비난은 취리히에 설립된 우익 조직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협회〉가 ‘신좌파의 파시즘’(The Fascism of the New Left)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히 공격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그 글은 바로의 진짜 목적이 “에코파시스트 독재”라고 주장했다. 바로는 이 주장에 대해 분개하며 부정했지만 곧 더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비난들은 그의 책 『구원의 논리』의 인용문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1992년 바로의 예전 당 동료인 유타 디트푸르트(Jutta Ditfurth)가 논쟁에 개입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마음에 불을 지피다』(Feuer in die Herzen)에서 바로가 비밀스럽고 권위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인 관념에 의지한다고 비난했다.
베를린에서 한 또 다른 활동으로서 1991년까지 바로는 니더슈탈트펠트(Niederstadtfeld)의 비영리기구 학습 워크숍(Lernwerkstatt)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구동독에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삶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슷한 실험을 계획했다. 1991년 여름 작센주 총리 쿠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와의 대화는 바우첸(Bautzen) 인근 폼리츠(Pommritz)의 마을에서 사회생태학적 미래학 프로젝트 〈좋은 삶〉(LebensGut)으로 이어졌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사회생태학 연구도 주로 바로의 이전 동료인 마이크 호상(Maik Hosang)에 의해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1993년 9월 바로의 아내 베아트리체가 부부싸움 이후 자살했다. 바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 학기 강의를 취소했다. 1994년 봄 그도 신체적으로 아팠다. 그해 가을 그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바로는 자신의 병이 아내의 자살과 같은 트라우마적 경험의 결과라고 확신했고 관례적인 치료법을 거부했다. 대신 다양한 대안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을 시도했고 수도원에 잠시 들어가기도 했다. 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난 뒤에야 그는 다른 화학요법 코스에 동의했다. 1995년 5월 그의 병상에서 그는 여자친구이자 동지이며 한동안 그의 딸을 돌보기도 했던 마리나 레너트(Marina Lehnert)와 결혼했다.
병 때문에 1년간 쉰 뒤 1996년 여름 바로는 강의를 재개했지만 제한된 정도만 진행했다. 그는 1997년 7월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 후 그는 폐렴에 걸렸고 암이 재발했다.
루돌프 바로는 1997년 12월 5일 베를린에서 사망했고 베를린의 도로틴슈타트 공동묘지(Dorotheenstadt cemetery)에 묻혔다.
*영어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New Left Books/Verso, ISBN 0-86091-006-7 [1977 (German), 1978 (English)]
- Socialism and Survival [1980 (German); 1982 (English)]
- From Red To Green [1984]
- Building The Green Movement [1986]
- Avoiding Social & Ecological Disaster: The Politics of World Transformation [1987 (German), 1994 (English)]
- “Rapallo? Why Not? Reply to Gorz”. Telos 51 (Spring 1982). New York: Telos Press
*참고자료: Rudolf Bahro, en.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