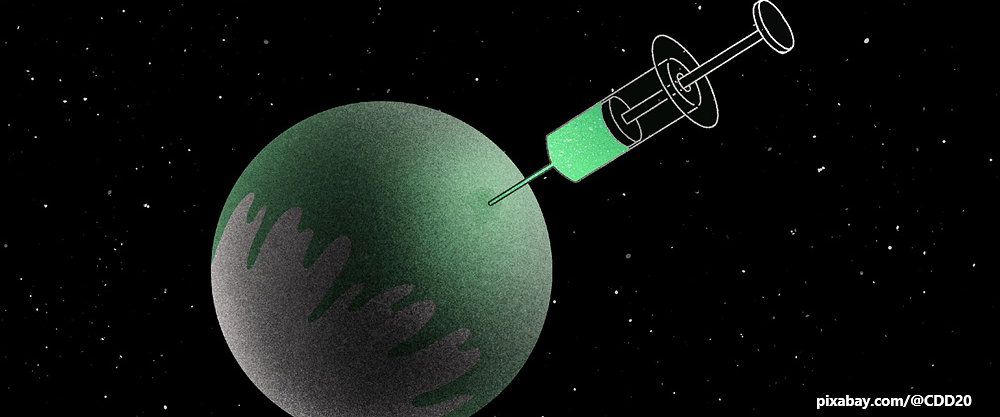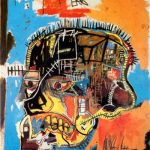| * 이 글은 지난 2024년 12월 6일(금)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2024한국기본소득포럼-‘생태-사회-경제’의 단초를 찾아서〉 중 「탈성장과 기본소득」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생태적지혜》에 게재합니다. |
1.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기후위기 대응, 더 넓게 보아 생태적 전환에서 ‘탈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전통적인 좌파 또는 사회과학 연구자들뿐 아니라 오히려 기후학자와 공학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새로운 경제학을 요청하는 지금의 상황은 흥미롭고도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인식에는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만 상태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엔트로피’, 제한된 시공간에서 생산과 폐기의 동적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총처리량(throughput)’, 2차 대전 이후의 ‘대가속(great acceleration)’ 같은 개념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런 개념들이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생태마르크스주의 이론, 예를 들어 ‘물질대사 균열(metabolic rift)’ 접근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측면들이다.
‘탈동조화(decoupling)’ 논의도 그런 차원의 인식을 심화한다. 최근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현실에서 탈동조화가 의미 있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위(지구적, 지역적), 지속성(일시적, 영구적), 규모(충분한, 불충분한), 평등(탈동조화 노력의 정의로운 배분)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 압력의 탈동조화의 경험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원 사용 관점에서 보면 전 지구적 채굴 자원량은 경제성장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추이는 경제성장률과 가장 유의미하게 연관된다.1
실제로 IPCC의 1.5도 시나리오들은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큰 네거티브 배출과 전례 없는 기술 변화의 조합에 의존해왔다. 카이서와 렌첸(Keyßer & Lenzen)은 이제까지 기후 통합 평가 모델(IAM) 연구자들과 IPCC는 엄격한 기후 완화 조치로 인해 경제적 산출이 감소하는 탈성장 시나리오를 관심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탈성장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탐색한다. 그들의 연구는 탈성장 시나리오가 에너지-GDP 탈동조화에 대한 높은 의존,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및 대규모 고속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존 등과 같은 기술 중심 경로들과 비교하여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의 많은 주요 위험을 최소화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이 남아 있지만, 1.5도 목표 달성의 탈성장 경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2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과학적 결론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교들이다. 탈성장 연구자들은 UBI(보편적 기본소득)과 UBS(보편적 기본소득)이 그러한 가교 중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탈성장으로 가는 가교로서 기본소득

『미래는 탈성장』의 저자들은 탈성장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다음을 꼽는다. 첫째, 지구적 생태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삶의 방식이 장기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구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물질적 신진대사를 변화, 감소시켜 생산과 소비 또한 변화,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 정의와 자기 결정을 강화하고, 이러한 변화된 신진대사 조건에서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제도와 인프라를 재설계하여 그것들의 작동이 성장과 끊임없는 확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3
물론 이러한 원칙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탈성장 개념어 사전』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시 땅으로, 기본소득과 최대 소득, 공동체 통화, 협동조합, 부채 감사, 디지털 공유물, 불복종, 생태 공동체, 인디그나도스(점령), 일자리 보장, 공공 자금, 신경제, 나우토피아, 탈성장 과학, 노동조합, 도시 텃밭, 일자리 나누기, 부엔 비비르, 영속의 경제, 페미니스트 경제학, 우분투 등이다.4 그리고 제이슨 히켈은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유사하지만 정치경제적 프로그램의 형태로 일련의 제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계획된 진부화를 끝내기, 광고 줄이기, 소유권 대신 이용권의 보장, 식품 폐기 없애기, 생태계 파괴 산업 규모 줄이기, 공공재의 탈상품화와 커먼즈의 확장, 부채 탕감과 급진적 풍요, 새로운 화폐, 민주주의의 힘, 정신적 탈식민화와 생태주의 인식에 기반하는 두 번째 과학혁명, 포스트-자본주의의 새로운 윤리학이 포함된다.5
이러한 제안들에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최대 소득 상한선과 식품 폐기나 파괴적 산업 줄이기와 같은 직간접 규제와 억제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립적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물리적 및 경제적 수단과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화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다. 탈성장에게 자급(subsistence)과 공생공락(conviviality)이 그것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 중 무조건적 기본소득, 일자리 보장과 나누기, 소유권 대신 이용권, 공공재와 커먼즈의 확장은 UBI 및 UBS의 제안과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적 탈성장을 촉진하고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탈성장을 더욱 뒷받침하게 되어 정신적 탈식민화와 생태적 인식의 주류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성장이 생태적 전환으로 연결되는 데에 UBI 및 UBS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나와 있다.
루이스와 매슬린(Lewis & Maslin)는 무제한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런닝머신의 속도를 늦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여기서 덜 일하고 덜 소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를 강조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미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화와 지능형 기계가 대부분의 직업에서 점점 더 인간과 경쟁하게 되므로 이는 특히 중요하다. UBI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함께 막기 위해 ‘지구의 절반’을 재야생화할 것을 제안하는 에드워드 O. 윌슨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6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UBI와 환경 사이에는 또 다른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UBI가 돌봄 활동을 더 촉진한다는 것이다. 돌봄에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 자연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UBI가 주는 안정성과 여유만큼 돌봄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할 수 있다.7
스탠딩은 돌봄의 가치 보장이 GDP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돌봄 활동과 노동은 GDP 통계에서는 대부분이 완전히 무시된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활동은 정당하고 의미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멸종 위협과 전염병의 위협에 맞서 싸우려면 이러한 모든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3. 기본소득과 탈성장의 ‘호환성’
로혼과 맥크레리(Lawhon and McCreary)는 최근의 탈성장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속에서 UBI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UBI는 탈성장 문헌들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정책 제안이며, 많은 생태사회주의자들은 UBI가 특정 사회적 조건 하에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BI가 보수적 이데올로그나 당파들에 의해 다른 사회 안전망을 낮은 수준의 UBI로 대체하고 공정 임금 요구를 억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UBI는 초과 부를 억제하는 메커니즘과 결합함으로써 어떤 사회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어떤 사회 보호를 축소를 수반하지 않고도 지불될 수 있다. 또한 UBI에 대한 진보적인 지지는 공공 서비스의 지속 또는 향상 또는 UBS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8
나아가서 로혼과 맥크레리는 UBI가 생태사회주의와 탈성장의 선상에서 사회-생태적 전환을 가져오는 전략적 지렛대를 대표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UBI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장기 전략을 구상한다. 이들은 에릭 올린 라이트의 작업을 기반으로 탈상품화에서 UBI의 가능한 역할을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UBI가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UBI의 설계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생태적 영향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끝으로, 앙드레 고르츠가 UBI를 지지했으며, 특히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고 작업 자동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필요성, 바람직하지 않고 의미를 잃게 만드는 노동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활용을 요청했음을 환기한다.9
랭그리지(Nicholas Langridge)는 UBI와 탈성장 전환이 ‘이론적 호환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UBI는 포스트-성장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정책, 또는 ‘대표 정책’이며, 이제 “자기 시대를 맞이한 아이디어”로 묘사된다. 이러한 지지는 탈성장 전환에 따라 경제의 물질적 및 에너지 처리량을 공평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힘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UBI는 1)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2)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3) 강제적인 임금 노동에서 의미 있는 일로 그리고 돌봄 중심 일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4)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5) 생태적 한계 내에서 웰빙(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옹호된다.10
4. UBI와 UBS를 둘러싼 논쟁
그런데 랭그리지는 UBI에 대한 지지가 탈성장 문헌에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UBI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둘러싼 입장의 긴장에서부터, 강제적 임노동으로부터의 ‘퇴장 옵션’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UBI 지지자와 대신 UBS를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며, 또 다른 논쟁의 영역은 사회 내에서 돌봄 위기를 완화하고 돌봄에 부여되는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현금 지급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 산정에 관한 오랜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경험적 UBI 연구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탈성장 문헌에서 UBI가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BI가 생태적 전환과 탈성장으로 이어짐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11
그렇다면 UBI와 UBS는 우열이나 양자택일의 관계인 것일까? 이 논의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UBS는 UBI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UBS는 UBI 제안을 비판하거나 UBI의 약점이나 한계로 지적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컨대 UBI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UBI가 생산주의와 소비주의를 넘어설 직접적인 방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여전히 많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것으로 SUV나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더 다니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염려다. 그래서 현금 대신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의 필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환경적으로 장점이 더 확실하다는 논리다.
쿠트와 퍼시(Coote and Percy)의 경우, 비용의 경우 영국에서 UBS를 할 때 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사용량에 필요한 기기까지 추가해도 GDP 대비 1% 조금 넘는 정도 지출이며, 주거, 교통, 통신, 보육, 성인 돌봄을 다 합해도 GDP 대비 4.3% 정도가 될 것이라 제시한다.12 즉 UBS의 비용 자체가 크지 않으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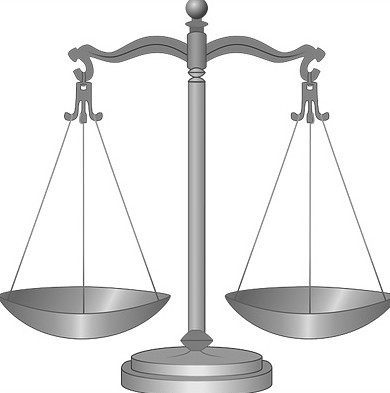
히켈 역시 탈성장과 기후 완화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핵심 통찰 중 하나는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가 정의롭고 효과적인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상적 생존 수단인 핵심적 사회 부문의 탈상품화와, 이를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처럼 의도적으로 형편없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고품질이며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괜찮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UBS를 정의한다. 그리고 UBS가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의료 및 교육, 주택, 대중교통, 식량, 에너지와 물, 커뮤니케이션, 보육과 노인 요양, 오락 시설 등을 제시한다. 또한 UBS는 일자리 보장 정책을 배제하지 않는다(Hickel, 2023).13
UBS는 역으로, GDP로 표현되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GDP 체제에 도전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UBS를 통해 특정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화폐 거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GDP 회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뷔흐스(Milena Büchs)는 그러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이 조직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UBS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면 GDP 성장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4
UBI와 UBS의 비교 또는 관계에 대해서, 최근 연구자들은 이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병행하여 제도와 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UBS가 도입되고 확대될 경우 UB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도 의도했던 효과를 낼 수 있고 재원 조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의는 어떤 제도의 장단점을 정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생태적 전환 또는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제도와 운동이 어떤 동학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거나 가로막는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질문 속에서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탈성장 프로그램 중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재지역화 요구에 UBI와 UBS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다.
5. 노동시간 단축과 재지역화의 경우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배출 저감의 유망한 대응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줄리엣 쇼어(J.B. Schor)는 유급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전반적인 단축을 통해 덜 상품 집약적인 생활방식의 형태로 환경소비가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지며 주변 지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3중 배당’ 효과를 기대한다.15 영국의 환경 및 사회단체인 플랫폼런던(PlatformLondon)의 “시간을 멈춰라(Stop the Clock)”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주4일 근무제로 전환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억2700만 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3%에 해당하는 양이다. 주 4일제가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조합 일각에서도 주 4일제 실험이 시나브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총급여 수준이 보장되거나, 절대적 급여 총액이 낮아지더라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필수 생계비의 결과적 감소를 통해 이것이 벌충되어야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단지 수량적 벌충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으로도 벌충되고 생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UBI와 UBS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묶여서 제안되는 이유다.
한편, 재지역화는 기후위기의 적응 측면에서 중요하다. 『심층적응』의 저자들도 기후 붕괴 시대에 심층적응의 한 해법으로서 재지역화, 즉 지역 자립 기반과 회복력 고양이 중요하다고 본다.16 이렇게 범위와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도 없는 세계”가 될 기후위기 상황에서 UBI와 UBS는 서로에 대한 연대와 여전히 중요할 공동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기본소득 연구자는 2020년 홍수 이전에 현금 지원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비교하여, 지원을 받은 가족들이 기아 감소, 더 나은 대피 가능성, 회복력 향상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UBI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환에서 특히 농업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재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된다. 빈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먹을 만큼만 키우는 생계형 농부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중동 전역에서 수 세기 동안 농업을 지원했던 지역의 작물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기근이 발생하여 많은 가족이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농부들이 너무 가난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충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혁신(작물 돌려짓기, 비료, 인증된 종자 품종)이 있다. 연구자들은 말라위에서 이러한 재배 방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400달러의 무조건적 현금을 두 번에 걸쳐 제공했다. 6개월 후,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개량된 종자를 구입하는 가족이 48% 증가했으며 윤작/혼합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
기본소득은 특히 지역통화를 통해 공급될 때 재지역화에 도움이 된다. 폴 아리에스(Paul Ariès)는 가능한 경우 지역통화를 사용하여 높은 사회적,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의 활동 재배치를 촉진하고 공통재에 대한 접근권의 형태로 필수적인 부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18
한국에서는 친환경 직불제 도입 또는 농촌 기본소득의 형태로 비슷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초보적이다. 마강래 교수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지로 지역으로 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19 이러한 아이디어에도 기본 소득과 서비스 제공이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환의 내러티브로서의 UBI와 UBS

사진 출처 : ElisaRiva
기후위기는 한 번에 다가오고 끝이 나는 종말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 이후에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무한한 성장주의의 논리와 이데올로기가 갖는 물질적 힘이다. 이러한 상황은 핫 하우스 지구의 시나리오를 통해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는 타개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가능한 사회경제적 해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효능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주의에 갇힌 상상력을 해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만들 수 있다.
UBI와 UBS는 수량적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UBI와 UBS 모두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이나 지구의 절반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많은 논점이 존재하며 다른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동력도 함께 작용하여 거대한 전환의 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BI의 UBS 제안을 전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것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통한 머지않은 미래의 생태공화국을 기획하는 일이다.
Timothée Parrique et al,, 2019, Decoupling debunked: Evidence and arguments against green growth as a sol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Lorenz T. Keyßer & Manfred Lenzen, 2021, “1.5 °C degrowth scenarios suggest the need for new mitigation pathways”,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2. (국역: 생태적지혜 웹사이트) ↩
마티아스 슈멜처 외, 2023, 『미래는 탈성장』, 김현우 이보아 역, 나름북스. ↩
자코모 달리사 외,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
제이슨 히켈, 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 민정희 역, 창비. ↩
사이먼 L. 루이스, 마크 A. 매슬린, 2020,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인류세가 빚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김아림 역, 세종서적. ↩
Guy Standing, 2020, “The Case for a Basic Income”, Opening essay for GTI Forum, “Universal Basic Income: Has the Time Come?”. ↩
Lawhon, M., and T. McCreary. 2020. “Beyond Jobs vs Environment: On the Potential of Universal Basic Income to Reconfigure Environmental Politics”, Antipode 52 (2): 23. ↩
Lawhon and McCreary, 같은 글. ↩
Nicholas Langridge, 2024, “Unconditional basic income and a degrowth transition: Adding empirical rigour to radical visions”, Futures, Volume 159, May 2024. ↩
Langridge, 같은 글. ↩
Anna Coote and Andrew Percy, 2020,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Cambridge: Polity. ↩
Jason Hickel, 2023, “Universal public services: the power of decommodifying survival”, August 4, 2023 (제이슨 히켈 블로그). ↩
Milena Büchs, 2021, “Sustainable welfare: How do universal basic income and universal basic services compare?”, Ecological Economics, Volume 189. ↩
김현우, 2018, 「노동시간 단축과 3중의 배당」, 레디앙, 2018. 02. 23. ↩
젬 벤델 외, 2022, 『심층적응』, 김현우 외 역, 착한책가게. ↩
Esnatt Gondwe-Matekesa, 2022, “More climate funding should go directly to people in poverty”, GiveDirectly, Dec 20, 2022. ↩
Guillaume Allègre and Henri Sterdyniak, 2017, “Do we need a universal basic income? The state of the debate”, ofce le blog ↩
마강래, 2020,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개마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