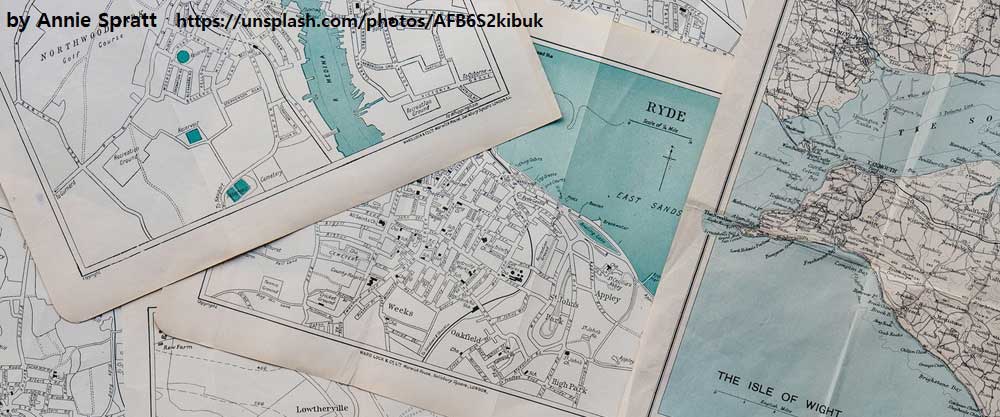지금까지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철학 전반에서 도출된 방법론을 통해서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소수자되기, 배치,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의 기후정의 개념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기후정의에 대한 기존 문제의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실험적인 전략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정의의 차원에서 주목할 점은, 이 거대한 문제설정에 대면하여 민감성과 대응력을 키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색다른 전략적 지도제작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성적 협치나 생명민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 반복될 수도 있다. 끊임없이 궁리되고 고민되고 모색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설정에 대한 고민이 성숙되어 가고, 무수한 지도그리기가 이루어지고, 색다른 특이점을 개척하는 재특이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 출처 : Shane Rounce
기후정의의 관련 의제의 시급함은, 최근 호주연구팀이 발표한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이 없다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끝, 죽음, 유한성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물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팀은 전시상황에 필적할 행동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생태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총동원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문제설정이 분명하다면, 수많은 사람을 연루시키고,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수많은 생명민회의 모듈조직들이 생산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가타리의 전략적 지도제작은 사랑, 욕망, 정동, 돌봄의 힘을 마비시키는 금욕주의는 더 이상 생태주의가 아니라는 점에 기반한다. 오히려 사랑, 욕망, 정동의 흐름을 최대한 끌어올려 공동체와 사회에 생명에너지와 활력을 높이면서도, 이를 탄소소비나 이익, 이해로 귀결시키고 수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가타리의 전략이다. 즉 최근의 공공영역에서 펼쳐야 할 전략은, 관계가 있는 곳에 자원이 돌게 만들고, 자원이 있어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어야 자원이 돌게 만드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가타리의 욕망해방, 정동해방의 전략적 지도제작의 방법론이다.
기후정의라는 아젠다에서 우리가 가타리로부터 취해야 할 전략적 지도제작의 방법론으로 『기계적 무의식』(2004, 푸른숲)이라는 문헌의 〈무의식의 강령〉을 참고해볼 수 있다. 전략적 지도제작을 위해 무의식의 강령에 기후정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타리의 ‘분열분석의 방법론’을 기후정의에 적용한 해석들
- 방해하지 마라 : 기후정의로 향한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 무언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 꼼짝 안하는 데 변화할 것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라! 하라!
- 무의식의 청취는 진찰용 침대 뒤에 앉는 것이 아니다 :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무의식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 : 전염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기후정의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 입구와 출구는 일치하지 않으며, 전혀 의외의 특이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 어떤 콤플렉스도 결코 날려버릴 수도 넘어설 수도 없다 : 기후부정의와 관련된 분열의 논리 즉 이중구속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안고가야 하지만, 배치를 재배치하려는 끊임없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모든 원칙관념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 : 대담해져라!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실험하고 탐색하고 도전하라!
이는 기후정의와 관련된 색다른 담론적인 논의와 배치를 조성하기 위한 실험과 탐색의 여정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특이점이다. 이는 포스트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주체성 생산, 즉 그 일을 해낼 사람을 만들어낼 전망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과정 중 하나다. 이러한 재특이화 과정은, 완성형이란 없다는 점에서 과정형과 진행형만의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게 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기후정의의 문제설정을 우리는 대면해야 하며, 궁리하고 모색하고 탐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후정의가 그저 도달될 목표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써 전환사회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