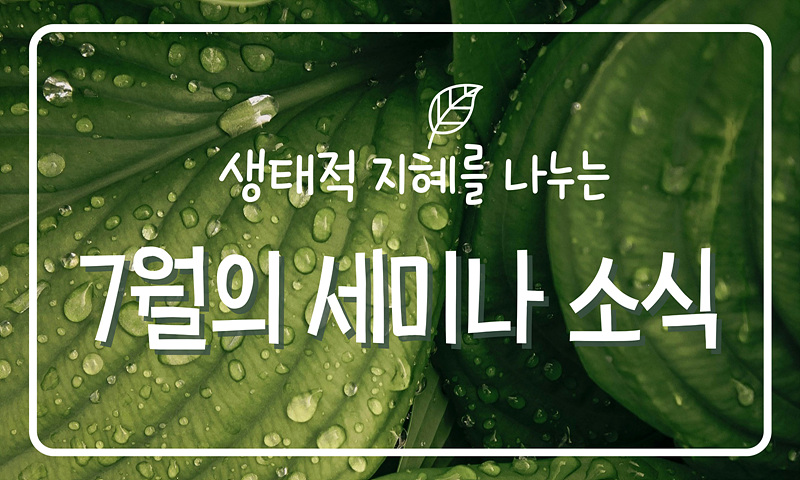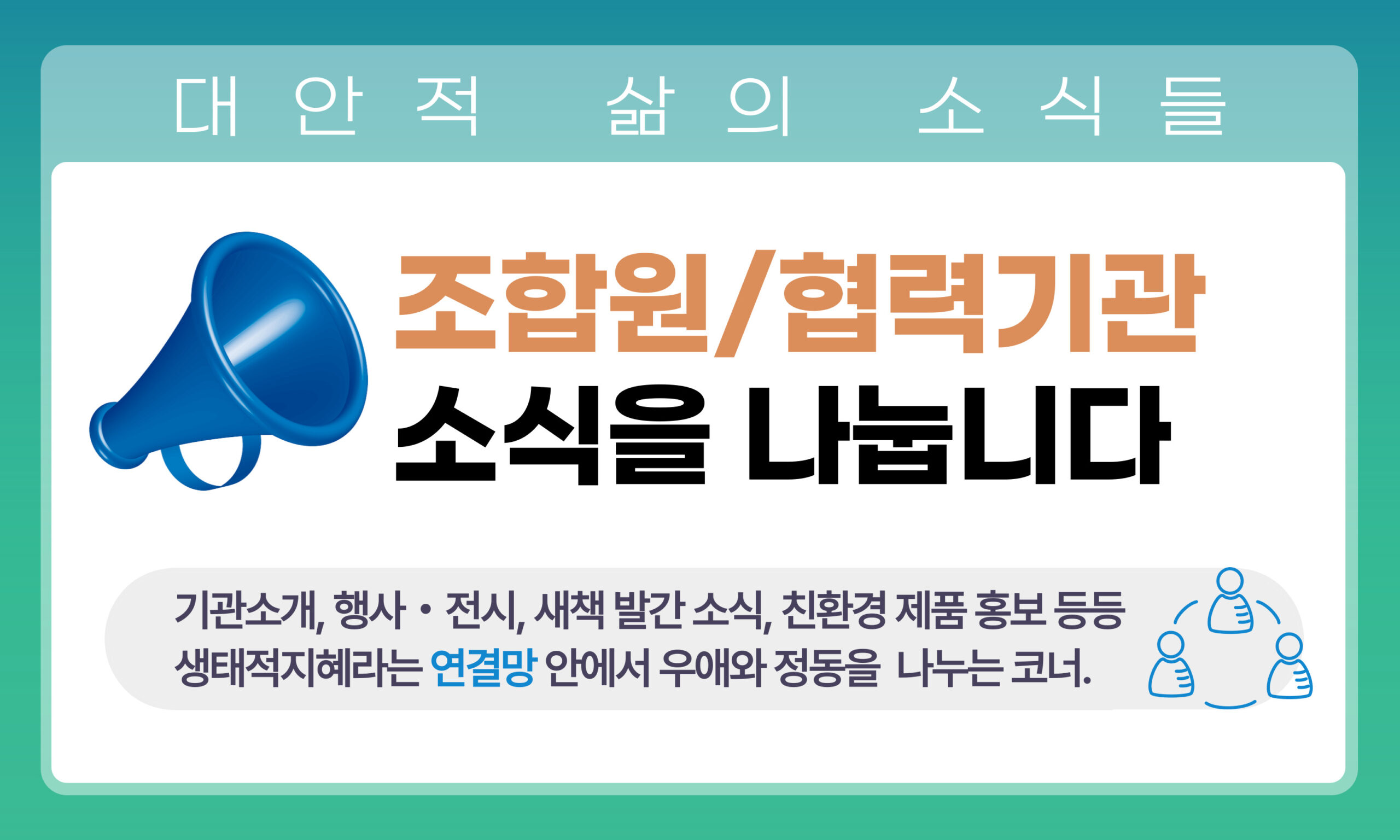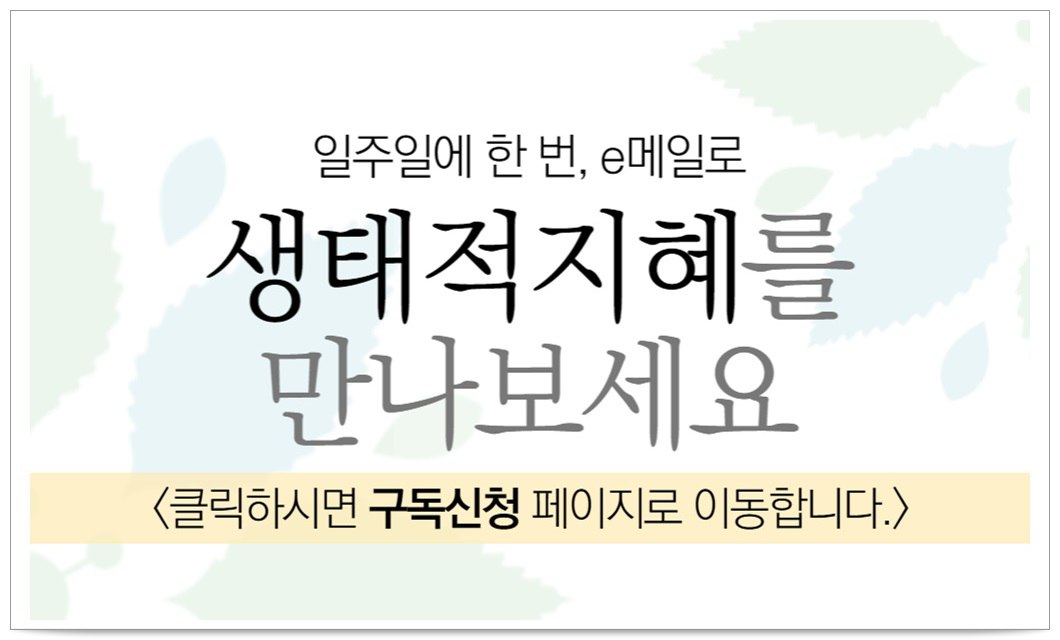나 말고 조금 더 당신에게 깊어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돌아보고 존중하고 돌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의 ‘시위’입니다. 부단히, 나는 나에게 저항합니다. 나는 나에게 시위합니다. 당신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시위하고, 나를 극복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과 빈곤문제. 이 모두 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가진 탓입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말해 선거대의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앗 그런데 3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현대에 ‘시민의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이와 할머니는 신호등 앞에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바람을 맞는다. 뒤흔드는 바람에도 흔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침묵의 봄'은 1962년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현대 환경 운동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파괴는 진행형이고, 1970년과 2017년 사이 북미에서 30억 마리 이상의 조류가 사라졌으며 조류 종(species)의 75%의 개체가 사라졌다. 이처럼 '침묵의 하늘'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조류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왔는지 그리고 그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곡은 ‘톱니바퀴 속 피어난’이란 곡입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발생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를 위한 추모의 노래입니다.
도플갱어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기 성찰과 윤리적 재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좌파/우파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조작하는 거울 이미지(mirroring image)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순히 좌파 비판서도, 우파 풍자도 아니다. 도플갱어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동일성’이라는 믿음을 흔들며 정치적 주체성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플갱어는 21세기 정치의 정체성 교란(dis-identification)에 대한 ‘언캐니(Das Unheimliche)’한 제언처럼 보인다.
지난해 계엄과 탄핵 국면, 그리고 최근의 대선 국면에서까지 우리는 살아서 생생하게 날뛰는 극우의 민낯을 마주했다. 우리는 이 집단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주해야 할까?
‘무사하다’는 말과 ‘일없다’는 말은, 뜻이 같아야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사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이 말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고, 이 말들이 지금 여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민들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살펴본다.

![[몸살 앓는 제주] ㉑ 국토부 앞 집시법 위반(?) 최후진술문](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20_오피니언_몸살-앓는-제주-21-국토부-앞-집시법위반-최후진술문_사진-main.jpg)
![[新유토피아 안내서] ② 민주주의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20_오피니언_新유토피아-안내서-②-민주주의의-과거가-현재를-살린다_김영준_main.jpg)
![[계절동화] ④ 6월의 나뭇잎들은 어떤 빛을 머금을까](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20_문화예술_계절동화-④-6월의-나뭇잎들은-어떤-빛을-머금을까_대문사진-e1751173600836.png)

![[월간 기후송_작곡일지 시즌2] ⑨ 톱니바퀴 속 피어난-AI 작곡편](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05_문화예술_월간-기후송_작곡일지-시즌2-⑨-톱니바퀴-속-피어난_사진-main.jpg)
![[콜로키움 특집] ③ 나와 닮은 적: 언캐니한 민주주의, 도플갱어의 문화정치학](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05_문화평_콜로키움-특집-③-21세기-정치의-정체성-교란에-대한-언캐니한-제언_사진main.jpg)
![[콜로키움 특집] ④ 도플갱어와 나는 연결돼 있다](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05_문화평_콜로키움-특집-④-도플갱어와-나는-연결돼-있다_사진-main.jpg)
![[한국철학 조각모음] 오늘도 무사히, 별일 없이 산다](https://ecosophialab.com/wp-content/uploads/2025/06/250605_문화평_한국철학-조각모음-오늘도-무사히-별일-없이-산다_이유진_main.jpg)